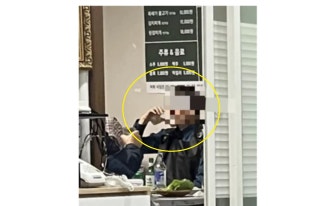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주제 ‘문명의 이웃들’은 동아시아 문명의 정체성과 역사를 말한다.
‘이웃’이라는 말은 단순한 지리적 인접이 아니다. 그것은 타자와 나, 전통과 현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일어나는 심미적 거리의 역동적 평행의 의미를 내포한다. 우리 문화는 이웃과 교섭하며 그 문화를 수용하면서 정체되지 않을 수 있었고, 역으로 이웃에 영향을 주어 문화의 탄력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웃은 타자가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는 토대다. 타자는 나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며, 그들은 나의 심연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다섯 가지 구획으로 이루어졌다. 목포문화예술회관부터 목포실내체육관, 남도전통미술관(진도), 땅끝순례문학관(해남), 고산윤선도박물관(녹우당·해남)에 이르기까지 물샐틈없이 이어진 전시들은 하나로 관통하는 특징을 지닌다. 기획자인 윤재갑 감독은 수묵을 단지 물질적 매체로서가 아니라 세계와 관계를 맺는 태도와 방식으로서 관계의 언어, 즉 세계와 소통하는 하나의 존재론적 방식을 여러 매체와 작가를 선정해 효과적으로 제시했다.
관람자로서, 그리고 학술 심포지엄 ‘전통의 혁신과 재료의 확장’에서 한 세션을 발표한 발표자로서 나는 이 비엔날레가 수묵의 언어를 다시 사유하고 재생하게 한 거대한 실험장으로 작동했다고 느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시장에 설치된 미디어 기반 수묵 작품이었다. 수묵의 농담(濃淡)이 디지털 언어로 번역되고, 먹의 여백이 데이터의 공백으로 치환되는 순간, 관객은 앞으로 도래할 디지털 수묵의 미래 가능성을 체감했을 것이라 느꼈다. 일본 미디어아트 그룹 팀랩의 출품작 ‘파도의 기억(Memory of Waves)’은 수묵의 기술적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수묵의 심리적 기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무한한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고 본다. 또 젊은 작가들의 다매체 설치작업들은 “수묵이 여전히 살아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적 방향성을 타고 재생하고 있거나 확장하고 있노라고 대답하는 듯했다.
대체로 전통 매체의 수묵화는 과거의 미감을 충실히 재현했으되 일부 작가의 작품에서는 ‘전통’과 ‘현재’ 사이의 긴장감이 경장돼 더 팽팽한 울림을 주는 듯 신선했다. 김현호·장재록·지민석·박웅규·박그림 등이 그랬다. ‘수묵의 사유’와 ‘수묵의 양식’이 분리되지 않도록 배려한 기획의 통합성이 이번 전시의 숨은 매력이기도 했다.
나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수묵을 하나의 단순한 기술적 재료가 아닌 시간의 철학, 즉 존재의 흔적과 소멸이 교차하는 장으로도 읽었다. 수묵은 과거의 매체이기에 전통적 지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급고(汲古)해야만 한다. 급고란 옛것에 물을 댄다는 뜻이다. 물이 닿을 때 과거의 매체는 새 생명성으로 활발발 살아나게 된다. 그 생명성이란 시간을 초월해 소통하는 지금 이 순간의 대화에서 비롯한다.
끝으로 말하자면 수묵이란 본래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것까지 담아야 하는 예술이기에 작가라면 형상과 무형의 정신적 경계에서 세계에 대한 사유와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속서나 속화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번 전시에 속서나 속화는 많지 않았다. 형식과 정신을 갖춘 작품이 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대부분 작품이 시대의 지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 기획자의 수준과 숨은 배려가 확인된다.
이번 전시회는 평담해 맛이 없는 듯하지만, 중화를 이루었다. 중화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조화를 말한다. 내용과 형식, 전통과 혁신, 동아시아의 문법과 서구의 문법, 원로와 중진, 과거와 미래, 그 모든 면에서 두루 중화를 이룬 것 같았다. 나는 이 전시를 기획한 디렉터 역시 평담해 맛이 없는 것 같지만, 또한 언제나 중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