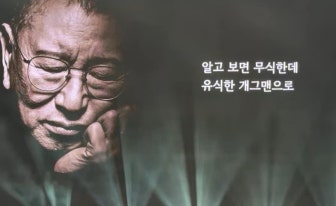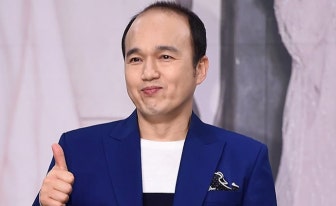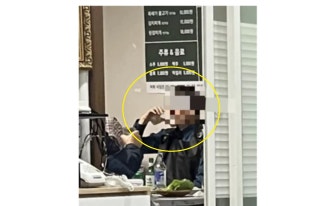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대출 90%까지 나온댔는데”…이자에 울상
공급 급증에 공실 속출…담보가치는 하락
다수 지산, 대출 축소로 어려움…연쇄 효과도[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1000억원대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때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지식산업센터가 이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이 속출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막히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22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수분양자 230여명은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시행사인 주식회사 익원과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반환 및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휘명과 법무법인 도아에 각각 160여명, 70여명의 수분양자가 모인 상황이다. 계속해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이 늘어나며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오산 소재의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은 현대건설이 시공에 참여하고 주식회사 익원(인창개발의 자회사)이 시행한 지식산업센터다. 경기 화성, 평택, 용인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중심지에 있어 분양 당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식산업센터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대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권유했지만 최근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일부만 나오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동규 변호사(법무법인 도아)는 “(시행사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원고 등에게 ‘대출이 무조건 90% 이상 나온다’, ‘아무 사업자든 발급을 받으면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다’는 등으로 원고 등에게 착오를 유발했다”며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확보한 통화와 메신저 내용 등을 살펴보면 분양대행사 직원은 분양 계약을 망설이는 고객에게 “계약금만 내면 다 해결해주겠다”, “해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을 늘려왔다”는 식으로 수분양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 A씨는 “대출이 안 나올까 불안해서 매번 물어봤는데 ‘10%만 (현금으로)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받아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지금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중도금 대출 갚는데 수백만원씩 깨지고 있다. 파산 직전”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분양을 받은 이들 중 은퇴 자금을 모두 투자한 퇴직자부터 주부까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지식산업센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식회사 익원 관계자는 “분양 당시에는 상품이 충분한 담보 가치가 나왔으니 당연히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과거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며 뒷짐을 져버린 것이다. 시행사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과거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까지 일부 확대하며 장려하던 정부가 정권이 바뀐 이후 대출 규제를 꺼내며 수분양자와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는 2020~2022년 투자호황을 누리며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중공된 지신삭업센터 1066곳 중 40% 가량이 공실로 남아있다. 공급은 늘었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규제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자 공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도래하자 은행은 지식산업센터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시작되면 잔금은 지식산업센터 담보 대출(LTV)로 전환되는데 공실이 증가하며 담보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용대출도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대출 가능금액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외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금융권의 대출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면 수분양자가 파산하고 이에 따라 잔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한 시행사가 망하고, 결국 시공사에게 돈을 주지 못해 연쇄반응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