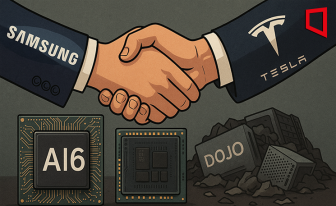세입자 잡는 허위매물의 실체 1편
2020년 공인중개사법 시행
허위매물에 과태료 부과
허위매물 여전히 기승
세입자 필수 정보 왜곡세입자를 노리는 허위매물. 이를 뿌리뽑기 위해 법도 바꾸고, 처벌 조항도 무겁게 뒀다. 이게 2020년의 일이니, 햇수로 벌써 5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대학가 매물 10건 중 3건은 허위매물이다. 방법이 없는 걸까. 더스쿠프가 '허위매물의 실태와 근절법'을 두편에 걸쳐 취재했다.
몇억원씩 되는 상품을 거래할 일이 인생에 몇번이나 있을까. 보통은 흔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 거래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다. 집을 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세입자라면 '집의 가치보다 융자금이 더 많은 집'을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융자금 등의 정보가 가짜일 수도 있다.
물론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다. 정부는 2020년 '허위 매물'을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했는데, 그 내용(제10조의2)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개물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광고해선 안 된다. 여기서 세가지는 ▲중개대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경우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ㆍ과장한 중개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0.5%)를 감안했을 때 10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받는 금액에 육박한다. 과태료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도 허위매물 광고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법을 개정하고 과태료를 적용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짜 매물 정보'가 여전히 넘쳐난다. 청년 세입자가 많은 지역은 특히 심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5주간 20대의 거주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에서 '가짜 매물 정보'를 확인했다. 네이버부동산ㆍ직방ㆍ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ㆍ블로그ㆍ카페처럼 개인이 자유롭게 매물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곳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1100건의 매물 광고 중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는 321건으로, 10건 중 3건꼴이나 됐다. 적발된 광고의 51.7%는 가격ㆍ면적ㆍ융자금 등이 거짓이었다.
세입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을 허위로 기록한 셈인데, 융자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융자금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다. 보증금 반환을 우려하는 청년 세입자 중 상당수는 건물의 융자금이 건물 가격의 절반 이하인 매물만 찾기도 한다.
허위매물을 단속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매물 신고가 대량으로 들어올 경우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적발을 해도 간판을 바꿔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허위매물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하다. 법의 적용과 처벌 대상이 '공인중개사'뿐이어서다. 네이버부동산ㆍ직방ㆍ당근마켓 등 부동산 플랫폼에 '허위매물'을 올린 주체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 SNSㆍ카페 등도 마찬가지다.
물론 '부동산 매물'의 업로드를 허용하고 운영하는 네이버ㆍ직방 등 플랫폼들은 허위매물을 직접 적발하거나 신고하는 통로를 마련해뒀다. 자체적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받고 처리하는 기구를 둔 네이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유튜브 등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에 '자율규제책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
국토교통부가 허위매물을 적발하기 위해 설립한 센터(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효용성도 높지 않다. 무엇보다 허위매물을 확인하기 위해선 신고가 들어와야 한다. 신고를 받지 않은 채 허위매물을 적발하려면 하루에 올라오는 매물을 전국 단위로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론 상시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부동산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매물을 솎아내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 '허위매물 이대로 괜찮나' 2편에서 그 방법론을 찾아보자.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릴 경우 최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10/22/0000006027_001_20251022114111096.jpg?type=w860)
![[사진 | 뉴시스,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 | 대학가 7~8월 기준]](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10/22/0000006027_002_20251022114111165.jpg?type=w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