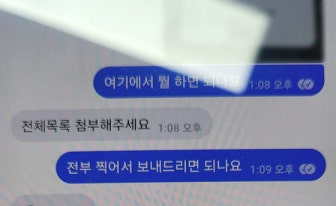이승하의 '내가 읽은 이 시를'
정하선 시인의 '방음벽'
귀 기울여 말 들어주는 사람들
소리 듣고 침묵 지키는 방음벽
방음벽
천 개의 귀가 있어도 입이 없는 저 사람
소형차의 아양 떠는 목소리도 고급 승용차의 거드름 피우는 헛기침도 낡은 트럭의 고달픈 하소연도 대형 트레일러의 우락부락한 굉음도 귀 세워 듣기만 하고 입 다물고 있다
불평은 물론 맞장구칠 줄도 모른다 격려의 말도 칭찬의 말도 할 줄 모른다 인색하다고 할 정도로 무표정하다 얼굴 표정이 없는 친구가 든 화투패처럼 속을 읽을 수 없다
매연 같은 말들 다 가슴에 담아두고 감추어두고
근질근질한 입을 허공으로 틀어막고 있다
사람의 귀는 두 개밖에 없어도 화의 뿌리가 입으로 뻗어 자라나 톱이나 도끼를 맞기도 하는데, 수천 개의 귀로 듣고도 세상 사람들 길가는 얘기들을 소리와 고요의 경계로 막고 있는, 부처님의 미소마저 본 따지 않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는 저 면벽
언젠가는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 세상에 다 뱉어낼 것도 같은데, 그러지는 않으리라는 얇아도 두터운 저 믿음
「가볍고, 경쾌하게」, 시산맥, 2023년
이 시의 제목을 '벽창호'나 '아주 오랜 침묵' 같은 것으로 하면 어땠을까. 우리는 '방음벽' 하면 도롯가에 길게 서 있는 방음벽을 연상하는데, 이 시는 그 어떤 소리에도 대응하지 않는, 귀가 먼 사람의 이야기 같다. 아무튼 방음벽은 그 어떤 차량이 내는 소리도 귀를 세워 듣기만 한다. 아무 말 없이.
어떤 사람은 구설수에 오르면 변명을 하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은 며칠 말을 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져서 몸이 뒤틀린다. 절에 가 부처상을 보면 유독 귀가 크다. 중생의 하소연을 듣기 위해서라고 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좋지만 귀를 잘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시인은 "부처님의 미소마저 본 따지 않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는 저 면벽"을 배우고 싶어 한다. 이 시에서 방음벽은 소리를 막는 이미지보다는 소리를 듣기만 하고 침묵을 지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 집에서 내는 소리가 저 집 사람의 귀에 들릴 때, 층간소음이라고 해 다툼의 주요 이유가 되곤 한다. 살인사건까지 일어난다. 정하선 시인과 시의 화자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 방음벽의 침묵을 "얇아도 두터운 저 믿음"으로 규정지은 시인의 혜안에 고개를 숙인다.
이승하 시인 | 더스쿠프
shpoe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