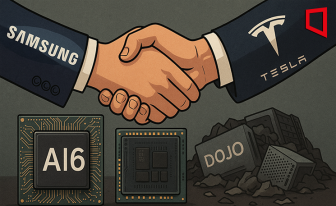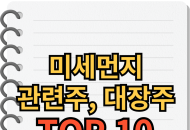정부가 알아야 할 빈집 활용법 1편
정비사업에 빈집정비형 추가
지자체별 빈집 활용 활발해
공공임대나 생활형 인프라 만들어
쓰지 않는 땅 어떻게 써야 하나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얼마나 될까. 미분양 주택 이야기가 아니다.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은 집, 빈집 이야기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 있는 빈집은 13만4009호다. 이런 빈집만 잘 활용해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빈집을 활용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더스쿠프가 빈집 활용법을 3편에 걸쳐서 제시해봤다.
[視리즈 빈집 활용법]
· 1편: 빈집 비중 줄지 않는 이유
· 2편: 공공임대주택과 빈집의 함수
· 3편: 빈집 줄이고 싶다면…
쓰지 않는 땅은 흔히 '노는 땅'이라고 불린다. 집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품지 못한 '노는 집'들이 있다. 다름 아닌 빈집이다. 누군가는 좋은 집이 없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런 '빈집'을 그대로 두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유다. 문제는 빈집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란 점이다. 視리즈 이젠 고민해야 할 '빈집 활용법' 1편이다.
도시에는 모순이 있다. 집이 모자라지만 역설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도 많다. 살 집이 모자란데도 이 집들은 왜 비어 있는 걸까. 이유는 다양하다. 너무 낡아서 살 수 없거나 생활하기에 불편한 곳에 있어서다. 이유가 어찌 됐든 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이 비어 있는 집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노후주거지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노후주거지 지원사업은 기존 재개발ㆍ재건축과는 다르다.
재개발 사업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새집을 짓지만 노후주거지 지원사업은 그보다 규모가 작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 기반ㆍ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한번에 밀고 한번에 세우는 게 아니라 집과 골목을 고쳐 쓰게 한다는 게 골자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빈집정비형'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면서 낡기만 한 집이 아니라 비어 있는 집도 노후주거지 지원사업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가 빈집에 관심을 둔 이유는 뭘까. 그 속내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주택 중 빈집 비중은 2018년 8.1%에서 2024년 8.0%로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빈집 관련 정책'을 펼쳤는데도 성과가 크지 않았단 건데, 이는 이재명 정부가 노후주거지 지원사업에 '빈집 정책'을 포함한 배경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빈집 정책은 실패한 걸까. 그래서 정부가 보완하겠다고 나선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만은 않다. 이쯤에서 지자체의 빈집 정책을 살펴보자. 정부는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집 정비'를 시작했다.
■ 서울시의 노력 = 서울시는 2022년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빈집을 정비해 어린이 놀이터와 지하주차장을 입체 개발했다. 노후주거지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만든 셈이다. 빈집을 철거하고 골목 속 생활 정원이나 평지 주차장을 만든 사례가 있다.
빈집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경우도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초행지붕'이 대표적이다. 초행지붕은 빈집을 철거하고 원룸 다가구 주택을 만들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면적으로 재개발을 하지 않아도 빈집을 '살 수 있는 집'으로 바꾸는 정책이다. SH의 초행지붕 사업은 2024년에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동에서 이뤄졌다. 2025년에도 은평구 역촌동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모든 빈집이 이런 공공임대주택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2024년 기준 서울에 있는 빈집은 총 6711호였다. 25개 자치구로 구분해서 보면 성북구(878호), 용산구(689호), 강북구(512호) 순으로 빈집이 많다. 이 3개 자치구는 이미 도시정비계획이 잡혀 있어 대규모 철거 후 주택 건설이 예정돼 있다. 해당 지역에 빈집이 많아도 SOC를 확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거다.
■ 수도권ㆍ비수도권의 노력 = 모든 빈집이 이런 딜레마 상태에 있는 건 아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적극적으로 빈집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거나 정원을 만들었고 경상남도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나눔주택, 청년 예술촌, 한옥 재생 센터 등을 조성했다.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에서는 빈집을 매입 후 철거해 시니어 운동시설을 만들기도 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위험이 있다보니 빈집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도 빈집을 활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인천에서는 완전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방식 대신 긴급 임시 거주지 등으로 빈집을 활용하고 있다. 새 집을 만드는 대신 빈집의 리모델링을 선택한 것이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65억원을 들여 빈집활용 시범사업으로 아동돌봄센터를 만들었다. 수도권이지만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남아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다.
이처럼 빌딩을 만들어 아동돌봄센터로 활용하고, 공동주택에 생긴 빈집을 리모델링해 긴급 임시 주거지로 만드는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빈집 사례'는 다양하다. 그런데도 앞서 언급했듯 빈집 비중이 크게 줄지 않은 이유는 빈집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로 주택이 모자란 서울에서는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 있지만 공급 물량은 많지 않다. 도시정비사업과 얽혀 있는 빈집에는 지원책을 쓰기도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빈집 지원책은 이런 딜레마를 풀어낼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지자체마다 목적에 맞춰 빈집을 활용한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10/06/0000005918_001_20251006110311119.jpg?type=w860)
![[자료 | 통계청]](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10/06/0000005918_004_20251006110311253.jpg?type=w860)
![[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10/06/0000005918_005_20251006110311289.jpg?type=w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