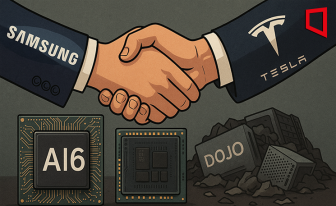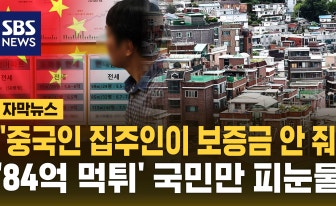미국 통상 압박에 운명 갈려
EU, 구글 누적 벌금 15조원
한국, 온플법 사실상 포기
유럽 비제조 기업들 성장하는데
한국, 제조 대기업에 초점
스타트업 2%만 제조 진입
재벌 자본집중·독과점 손 뗀 결과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경제의 미래가 지난 5일(현지시간)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똑같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시달렸지만, EU는 구글에 누적 과징금 15조여원을 부과했지만, 우리는 그 기반이 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제 두 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더스쿠프가 자세히 알아봤다.
■ 관점① EU-한국 플랫폼 동상이몽=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 회사인 구글이 2014년부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에 불리하게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4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2017년엔 구글이 쇼핑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에 대한 과징금으로 24억2000만 유로(약 3조9414억원)를, 2018년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과징금으로 43억4000만 유로(약 7조684억원)를 부과했다. [※참고: 2019년 구글 애드센스 관련 과징금 14억9000만 유로 포함.] 이를 합치면 지금까지 EU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은 112억 유로로, 우리 돈으로 15조8144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같은 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EU처럼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독점 규제 플랫폼법(온라인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어제(4일)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한국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상황이다. 온라인플랫폼법 논의가 급진전하던 3년 전쯤 도입했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덜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의 원형은 EU가 구글에 15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디지털시장법(DMA)이다. EU가 2022년 11월 1일 발효해 2023년 5월부터 시행한 DMA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서비스와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면, 최대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미국과 트럼프는 미국 플랫폼 등 서비스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EU야말로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EU는 영국을 제외하고 독일·프랑스 등 유럽 27개국이 모인 국가연합이고, 최근 미국과 관세율 15%에 합의했다. EU 경제를 지탱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 중 하나도 우리처럼 자동차다. 상황은 우리보다 더 안 좋다.
독일 자동차 3사는 이미 생산량이 감소했고, 2019년 이후 5년 동안 일자리 11만2000개가 사라졌다. 올해 2분기 독일 자동차 산업 매출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경고한 대로 구글 처벌을 보복하는 차원에서 관세율을 올리면 그만큼 피해가 크다.
■관점② EU 공격의 배경=그런데 EU는 왜 우리와 달리 미국의 관세 정책에 반하는 '구글 규제'에 나설 수 있었을까. 유럽에는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업 대형 기업들이 여전히 많고, 기술 및 지식재산권(IP) 기반의 새로운 회사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제조업에도 희망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가령 '제조업의 나라'란 독일의 주식시장에서 수년간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SAP였다. SAP는 1972년 창업 후 줄곧 인사·회계 등 회사에서 사용하는 ERP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왔다.
무엇보다 유럽은 국가 자본이 여러 종류의 기업들에 비교적 골고루 분배되고 있다. 주식시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독일 SAP는 시가총액 1위 회사지만, 이 회사 시총이 전체 증시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0.1%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시총은 2880억9000만 달러로 전체 증시 시총의 9.1%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시총은 2539억4000만 달러로, 런던 증시 시총 4조770억 달러의 6.2%에 불과하다. 미국 증시 1위인 엔비디아의 시총 비중 역시 6.1%에 불과하다.
■ 관점③ 한국 백기의 배경=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시총 1위 회사는 삼성전자로 8일 현재 전체 증시 시총의 13.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소속된 대기업집단 삼성그룹 산하 상장사들의 시총으로 범위를 넓히면, 우리나라 증시 시총의 32.1%가 한명의 동일인 지배 아래 있다.
국내에서 시총이 두번째로 많은 SK하이닉스도 시총 비중은 6.5%이지만, SK그룹으로 넓히면 비중이 14.6%로 커진다. 두개 그룹이 한국 전체 시총의 거의 절반(46.7%)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 주요국 증시에는 시총 1위 기업이 산하 계열사를 상장시키는 경우가 없다. LVMH, 엔비디아,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업부를 분할해 상장하지 않았다. SAP가 2021년 산하 퀄트릭스를 상장시켰지만, 2018년 인수한 회사를 그대로 상장시킨 것이다.
주병기 후보자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의 지난 5일 발언 중에는 우리가 왜 미국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지 못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자본의 해외 유출이다. 주 후보자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이른바 재벌이 국외 계열사를 통해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을 두고 "심각한 문제이며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쉽게 말해, 재벌이 계열사를 국내 중복 상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로 해당 회사의 본사를 옮겨서 직상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회사는 주로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맡겨두고, 이 예탁기관이 현지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해외 자본을 조달해 왔다. 하지만 그 나라 증시에 직접 상장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장하는 회사의 본사를 해외로 옮겨야만 가능하다.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현재 5대 재벌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비제조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상장해도 자본 조달이 여의치 않다. 한국은행은 여러 차례 국내 자본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아닌 대기업에 몰리면서 저성장의 원인인 '총요소생산성 감소'라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래서 유명 스타트업은 일단 해외로 나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외 직상장, 본사 해외 이전, 해외 기업에 지분 판매로 성장하면, 우리의 경제 자산이 되기는 힘들다.
한국에서 시작한 쿠팡은 처음부터 본사가 미국에 있었고, 2021년 3월 뉴욕증시에 직상장했다. 네이버 자회사로 시작해 2016년 뉴욕증시와 도쿄증시에 상장했던 라인은 2020년 상장폐지하고,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편입됐다.
넥슨은 2011년 본사를 일본으로 옮겨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네이버웹툰은 2024년 6월 나스닥에 직상장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야놀자, 크래프트, 당근마켓 등 대형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해 상당수 지분을 취득했다.
■ 관점❸ 반론과 재반론=이 지점에서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혹시 우리나라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꿈꿀 만큼 제조업 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거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제조업 하기 좋은 환경이라기보다는 제조 대기업이 사세社勢를 유지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제조를 기피한다. 지난해 창업한 국내 스타트업은 118만2905개인데, 이 중 제조업을 택한 스타트업은 3만5087개로 전체 창업의 2%대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증시 시총의 대부분이 제조 대기업에 몰려있고, 국가도 제조업 우선 정책을 펴는데도, 정작 창업 기업은 대부분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업종인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의 배분은 물론이고 시장 지배력에서도 기존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추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2021년 기준 시장 구조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476개 산업에서 1위 기업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기업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는 무려 52개 업종에 달했다. 이 중 39개 산업은 2011년 이후 5회 연속으로 사실상 독과점 상태였다.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주병기 후보자는 구글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이 3년 전 시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비제조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이미 30년 전에 지났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30대 재벌 계열사 수를 819개에서 544개로 줄였지만, 2025년 기준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수는 3301개로 폭증했다(공정거래위원회).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지배구조를 그대로 두면서 문어발식 확장이나 중복 상장, 계열사간 합병 등으로 자본 배분이 왜곡되는 행위를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eongyeon.han@thescoop.co.kr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2023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에서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 EU는 5일 구글에 4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 |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09/08/0000005776_002_20250908191108921.jpg?type=w860)
![유럽연합은 2014년 이후 구글에 15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09/08/0000005776_004_20250908191109019.jpg?type=w860)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09/08/0000005776_003_20250908191108955.jpeg?type=w86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5/09/08/0000005776_001_20250908191108872.jpg?type=w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