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 절반 담당하지만 체력 부담 커
美 하버드대 “하루 4000보, 사망위험 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여성농업인 확대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2년 농가 인구 중 남성은 연평균 2.8%, 여성은 3.1% 줄어 여성의 감소폭이 더 컸다. 농업 부문 취업자도 남성은 늘어난 반면 여성은 줄어 2018년 43.8%였던 여성 비율이 2020년 41.3%로 낮아졌다.
농가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138만3000호였던 농가 수는 2020년 103만5000호로 25.2%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32.7%에서 56%로 뛰었다.
문제는 이들이 농사일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체력 부족(36.4%)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32.2%)이라는 점이다. 즉,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체력은 농사일 지속 여부와 직결된다. 고령 여성농업인이 건강 문제로 농작업을 중단하면 농작업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농업 현장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 리쿠타 하마야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노년 여성의 ‘걷기’ 효과 연구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팀은 평균 71.8세 여성 1만3547명을 대상으로 하루 걸음 수와 심혈관질환 및 사망 위험 간의 관계를 11년간 추적했다.
연구 결과 주 3회 이상 하루 4000보 이상 걷는 그룹은 걷지 않는 그룹에 비해 사망 위험이 40% 낮았다. 주 1~2회만 4000보 이상 걸어도 사망 위험은 26% 감소했다.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역시 하루 4000보 이상 걷는 날이 있는 그룹에서 27% 낮았다. 하루 평균 걸음 수가 많을수록 건강상 이점이 커져 5000보 이상이면 사망 위험이 약 30%, 6000~7000보 이상이면 40% 가까이 낮아졌다.
연구팀은 “걷기 빈도보다 걸음의 총량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매일 꾸준히 걷든, 며칠에 한번 몰아서 걷든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걸음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사일도 육체노동이지만 쪼그려 앉아 하는 김매기나 과일 수확 등은 특정 자세를 오래 유지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줄 뿐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유산소 운동 효과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농작업 중 이동 시간을 늘리거나 밭일 사이사이 의식적으로 걷는 시간을 확보하는 등 ‘걷기 총량’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 여성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하버드대 연구 결과는 농촌 현장에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 농사일 외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고령 여성농업인에게 ‘하루 4000보’ 걷기는 단순한 건강 습관을 넘어 농업 노동 지속성 확보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매일 걷지 못하더라도 일주일 총 걸음 수를 채우거나 농번기와 농한기에 맞춰 걷기 패턴을 조정하는 유연한 접근법 역시 현실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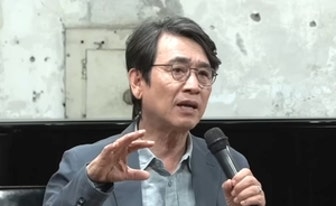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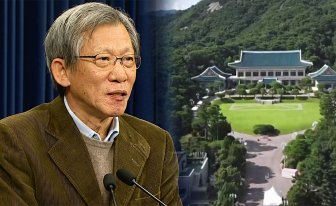
















.jpg?type=nf190_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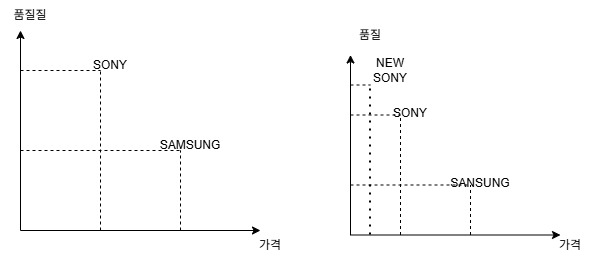.jp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