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소리 덧날 때 쓰는 사이시옷
한자어 합성어는 6개만 인정돼
먼저 ①뒷말 첫소리가 된소리가 될 때 사이시옷을 쓴다. 귓밥·맷돌·아랫집·쳇바퀴·햇볕 등 셀 수 없이 많다. ②뒷날·빗물·잇몸처럼 뒷말 첫소리가 ㄴ·ㅁ이면서 ㄴ 소리가 덧날 때도 쓴다. ③나뭇잎·뒷일·베갯잇처럼 뒷말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도 붙인다. 순우리말과 한자어 합성어도 마찬가지. ①은 귓병(-病)·자릿세(-貰)에서, ②는 제삿날(祭祀-)·툇마루(退-)에서, ③은 가욋일(加外-)·예삿일(例事-)에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자어+한자어 합성어는 어떨까? 국립국어원은 딱 6개 단어만 사이시옷을 허용한다. 그냥 외우자. 곳간(庫間)·셋방(貰房)·숫자(數字)·찻간(車間)·툇간(退間)·횟수(回數). 왜 외워야 하냐고? 각종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외우는 것 말고는 납득할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곳간이 맞으면 마구간(馬 間)도 마굿간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다. 셋방이 맞다면서 월세방(月貰房)·전세방(傳貰房)은 왜 월셋방·전셋방이 아닌지? 숫자가 맞다면서 오자(誤字)는 왜 옷자가 아니라 오자로 써야 하는지? 찻간은 맞는데 왜 기차간(汽車間)은 기찻간이 아닌지? 툇간은 맞는데 왜 툇자(退字)는 밀려나고 퇴짜가 남았는지? 횟수는 맞는데 왜 갯수는 틀리고 개수(個數)가 맞는지?
누군가는 “딱 6개라더니 더 있네!” 하면서 찻잔(茶+盞)을 떠올릴 수 있겠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찻잔은 ‘찻盞’으로, ‘차’를 고유어로 본다. 한문 시간에는 ‘茶’의 음을 ‘차’와 ‘다’ 두가지로 배우는데, 표준국어대사전으로 넘어오면 ‘다’ 하나만 되는 것이다!
사실 사잇소리 현상 자체가 들쭉날쭉하다. 반대말·예사말·인사말은 표준 발음으로는 사잇소리가 없지만 많은 언중은 [반댄말]·[예산말]·[인산말]처럼 읽는다. 노랫말·존댓말·혼잣말을 보면 무리도 아니다. 일부에선 사이시옷을 없애자고 한다. 그러면 갯가·깃발·봇물·샛길은 개가·기발·보물·새길이 돼 외려 혼란스러울 터다. 국립국어원도 몇해 전 사이시옷 활용 개선 방안을 조사했으나 당장 바꾸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수수께끼로 마무리한다. ‘사잇소리’에는 있는데 ‘사이시옷’에는 없는 것은 뭘까? (정답은 다음 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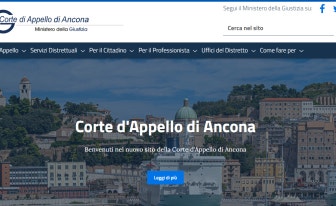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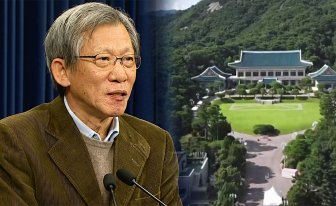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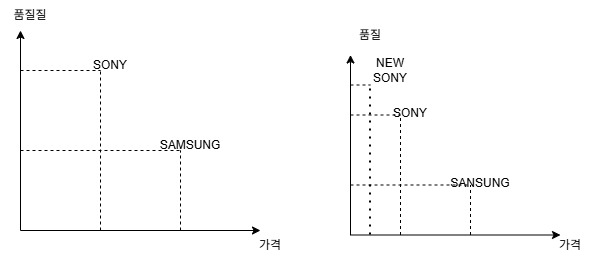.jpg?type=nf190_130)




.jpg?type=nf190_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