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가 농업의 체질을 다시 쓰고 있다
기온 1도의 차이가 작물의 당도를 바꾸고, 농가의 소득을 갈라놓습니다.
기후는 더 이상 날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의 문법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지훈의 ‘맥락’] 이번 편은 기후가 감귤의 시대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를 짚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후경제 세미나’에서 권오상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기후변화가 제주지역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분석했습니다.
■ 감귤의 땅,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제주 농지의 약 1만 9,000헥타르 중 감귤 재배지가 99%를 차지합니다.
사과·배·복숭아 같은 타 과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주 농업의 구조가 감귤 하나로 설명되는 이유입니다.
그중에서도 만감류(레드향·천혜향·한라봉 등)는 최근 5년 새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온도 상승이 빠른 적응 품종을 밀어올리고, 전통 감귤은 점점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온난화의 속도는 한 품종의 생애주기를 앞질렀습니다.
‘감귤의 섬’이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안의 품종·수익·기온은 이미 다른 흐름을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오상 교수는 “평균기온이 오를수록 감귤의 생육에는 긍정적이지만, 극단적 고온일수의 증가는 생산성을 정반대로 흔든다”며, “온도는 기회이자 리스크”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온이 1~2℃ 오르면 당도와 착과율이 개선되지만, 33℃ 이상에서는 열과(裂果) 현상으로 과피가 터지고 낙과가 급증합니다.
기후곡선이 감귤경제의 리듬을 흔들고 있습니다.
■ 시나리오가 갈라놓은 두 개의 미래
제주 농업이 마주한 건 ‘생산성’이 아니라 ‘구조의 선택’입니다. 같은 기온 상승이라도 어떤 구조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권 교수팀은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보수적 시나리오입니다.
만감류나 아열대 작물의 생산성 증가 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채소·과수 부문 부가가치는 –4%, 제주 지역 GRDP는 –0.33%(–675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귤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을 상쇄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적응형 시나리오입니다.
평균기온 상승이 일부 만감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반영했을 때 토지소득은 +5.6%, GRDP는 +0.1%(+254억 원) 증가했습니다.
적응 전략이 곧 회복력으로 작동한다는 결과입니다.
숫자는 냉정한데, 그 안에는 농가의 시간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기후 적응은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의 생존 전략입니다.
권 교수는 “기후 적응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적응 능력이 지역경제의 경쟁력으로 전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중산간으로 옮겨가는 밭, 재배지 이동이 시작됐다
기후 적응의 현장은 이미 변화 궤도에 올랐습니다.
노지감귤의 중심이던 해안지대에서 재배지가 점차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이 해안의 생육 불균형을 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서늘한 지역이 새 재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밭은 그대로지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감귤이라도 해발 300m의 하루는 해안의 하루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읽는 게 농업의 경쟁력입니다.
권 교수는 “재배고도의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이전”이라며, ”기후가 농업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지대 이전이 곧 해답은 아닙니다.
생산벨트의 이동이 인력, 물류, 기반시설까지 함께 옮겨가지 못하면 또 다른 불균형을 낳습니다.
‘온도 적응’을 넘어 ‘생활 적응’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 감귤경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감귤의 시대를 끝내는 게 아니라, 만감류 중심의 새로운 감귤경제를 여는 전환점으로 분석됩니다.
평균기온 상승이 불리하지 않다면 기후 적응은 제주 농업의 ‘두 번째 성장곡선’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량이 아니라 체질입니다.
기후가 상품성을 흔들면,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품종 전환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유통, 가격, 수출까지 기후 구조에 맞게 다시 짜야 합니다.
권 교수는 “기후는 더 이상 변수(variable)가 아니라 구조(parameter)”라며, “적응의 속도가 곧 산업의 생존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의 밭은 여전히 감귤로 가득하지만 그 감귤의 이름과 장소, 그리고 경제적 의미는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는 농업을 흔들고, 산업의 리듬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다음 편은 관광입니다.
농업의 균형이 기온의 곡선에 흔들렸다면, 관광의 리듬은 날씨의 속도에 맞춰 바뀌고 있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열대야의 반복은 여행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체류 기간은 짧아지고, 소비의 패턴은 ‘단기·저위험형’으로 이동했습니다.
③편에서는 이상욱 교수의 발표를 토대로 ‘기후가 바꾼 제주관광의 구조’와 ‘산업 리듬의 재편’을 분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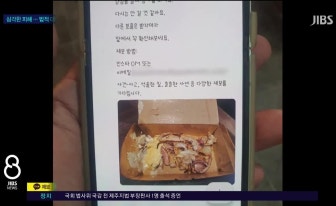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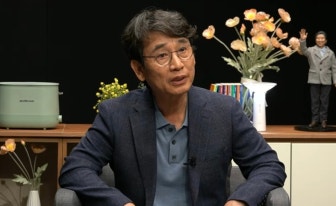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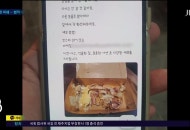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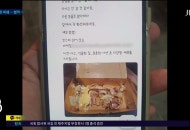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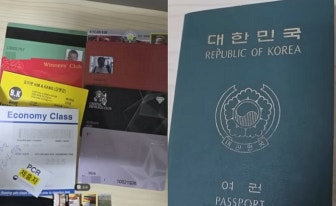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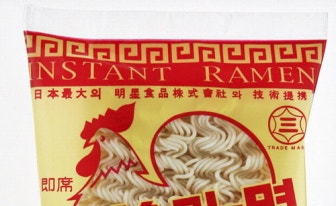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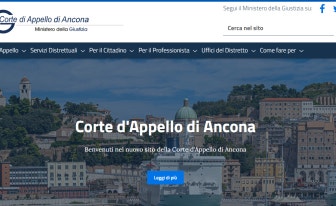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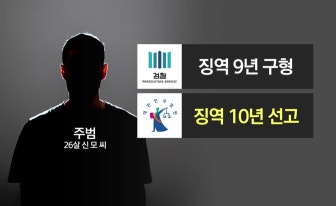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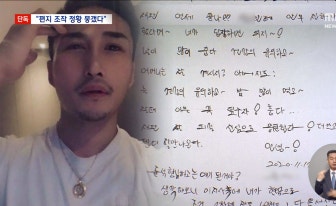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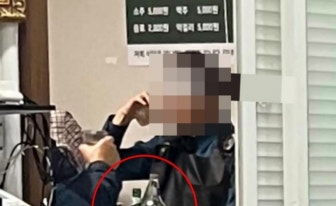












.jp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