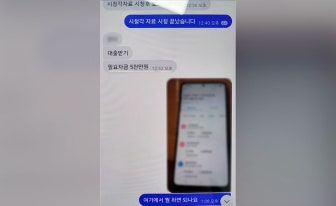“수치로는 비슷한데, 왜 사는 건 더 빠듯할까.”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보고서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올해 한국인의 ‘실질 체감소득’을 나타내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만 5,080달러로, 대만(8만 5,127달러)에 비해 약 2만 달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 명목에 가려진 격차, ‘체감소득’은 이미 대만에 밀렸다
2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PPP(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가 6만5,08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6만2,885달러)보다 3.5% 오른 수치지만, 세계 순위로는 35위에 머물렀습니다.
‘PPP’는 같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의 실질 구매력을 감안한 지표로,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 척도입니다.
한국은 1980년 2,200달러에서 2000년 1만 7,432달러, 2010년 3만 2,202달러, 2020년 4만 7,881달러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대만은 한 번도 한국에 뒤진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8만 달러를 넘어서며 미국(8만9,599달러) 바로 아래인 세계 12위에 올랐습니다.
‘명목 GDP 역전’보다 더 근본적인 ‘체감 격차’가 이미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 물가와 환율, 그리고 구조… ‘3중 악순환’이 체감소득을 갉아먹어
대만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7%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치 역시 1.5%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은 2%대가 고착화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물가상승률은 2.1%, 특히 가공식품 4.2%, 축산물 5.4%, 수산물 6.4%로 치솟았습니다.
‘먹는 물가’가 체감소득을 직접 잠식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변수입니다. 대만달러는 지난 10년간 27~32달러 범위에서 안정된 반면, 원화는 같은 기간 1,131원에서 1,400원대로 약 21% 절하됐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끌어내립니다.
여기에 구조적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국내 농축산물의 품목 다양성이 적어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며, “가격 구조를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물가, 환율, 구조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하며 국민의 체감소득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 “소득은 늘었다며, 왜 더 힘들까”
한국의 명목 1인당 GDP는 올해 3만 5,962달러로, 대만(3만 7,827달러)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체감은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대만에서는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지표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생활 현장의 체감온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라며,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격차를 정면으로 언급한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돈이 늘었는데도 더 힘든 이유’는 물가와 구조, 그리고 제도의 문제로 압축됩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삶의 온도는 여전히 냉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