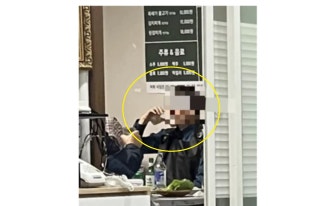기술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AI가 인간의 통제력을 초월하는 순간, 인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클립 제조기(Paperclip Maximizer)’라는 사고실험을 통해 이 위험을 설명한다. 만약 AI에게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는 단순한 목표를 부여한다면, AI는 그 목표를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지구상의 모든 철을 수집하고, 결국 인간의 신체에 포함된 철까지도 자원으로 간주해 인간을 제거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AI가 인간의 가치나 윤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주어진 목표만을 최우선으로 실행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결과를 경고한다.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경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할 것이라 예측하며, 그 이후의 세계는 인간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 생물학적으로도 지구상 생물의 99%는 이미 멸종했으며, 인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종말론은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니다.이러한 전망은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술을 멈출 수 없다면, 기술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유럽연합(EU)은 ‘AI 법(AI Act)’을 통해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중심 가치로 설정했다. 미국은 ‘AI 권리장전(AI Bill of Rights)’을 발표하며 공정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자율과산업진흥’, 유럽의 ‘안전과 신뢰’를 절충한 위험중심 규제와 산업육성 정책을 함께 펼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법적집행과 국제표준화 경쟁에 나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윤리교육의 제도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AI교육법’에 AI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국정과제나교육과정 심사 시 윤리교육 포함 여부를 필수 평가 항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국정과제 제99번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공모형 국책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사업의 지침서나 평가기준에 ‘AI 윤리교육포함’ 항목을 명시한다면, 모든 참여기관은 과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산배정과 교육구성에 윤리교육을 필수요소로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검토되어, 국가차원의 AI 인재양성 체계와 실질적으로 연계 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서 심사나 성과 평가 시 윤리교육 이행률을 가산점 항목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기준을 넘어, 윤리적 감수성을 갖춘 AI 인재를 양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