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8월 2019년 比 29% 급감
- 전국 中企제품 사상 최고와 대조
- 주요상권 붕괴로 쇼핑 핫플 실종
- 자금력 달려 색조화장품은 외면
- 피부관리실·병원 납품 치중 탓도
K-뷰티 열풍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매년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부산 화장품 업계는 ‘찬바람’만 맞고 있다. 10년 전 중국 한류를 타고 매년 30%가 넘는 고속 성장을 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전문가들은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호재에 대응할 마케팅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2019년 최고치 찍고 성장세 급감
14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8월 부산지역 화장품 업체 400여 곳의 수출액은 1억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5% 줄었다. 지난해 15.0%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수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된다.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2019년(2억4500만 달러)과 비교한 지난해 수출액(1억7400만 달러)도 29% 감소했다. 올해 수출탑 수상 기업은 아이피아코스메틱(300만 달러) 코스메디션(300만 달러) 에코마인(100만 달러) 등 3곳에 그칠 전망이다.
세계적인 K-뷰티 열풍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꾸준히 오르는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극명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보면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은 화장품(39억4000만 달러)이다. 전년동기 대비 19.7% 오르며 지난해 기록한 상반기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다. 29개월 연속 상승한 금액이다.
부산은 10년 전만 해도 중국발 한류 화장품 붐을 제대로 탔었다. 2015년 4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매년 30% 넘게 늘어 2018년 1억26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는 63.6% 상승해 2억 달러마저 넘어섰다. 이후 지자체 지원도 강화됐다. 부산테크노파크는 2019년 12월 기장군에 화장품공장을 준공해 지역 기업 생산을 지원했다. 이듬해 팬데믹이 확산했을 당시에는 임가공비 및 장비 사용료를 절반으로 줄여주기도 했다. 부산시도 2019년부터 시청 청사에 장터 ‘B-뷰티데이’를 개최해 판촉 활동을 도왔다.
▮쇼핑 핫플 없고, 마케팅 역량 떨어져
중국에 한류 화장품 붐이 일었을 당시만 해도 서면·남포동 상권이 어느 정도 건재했다.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이곳에 마련된 부산 화장품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면서 지역 상품이 널리 소개됐다. 부산화장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마케팅 준비 단계에서 서울 쪽 팝업 스토어부터 찾는 기업이 적지 않다. 온라인이 대세라고는 하지만, 소위 ‘붐’을 일으키는 발원지는 오프라인이다. 성수동 같은 상징적인 쇼핑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화장품 기업이 영업력이 부족해 기초화장품 생산에 치중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K-뷰티 붐의 한 축은 색조화장품이 이끌고 있다.
화장품 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테크노파크 라이프센터 관계자는 “색조화장품은 외주로 한 번에 다양한 색상을 주문해야 하는데 색상당 최소 주문량을 맞추면 기초화장품 대비 발주량이 엄청 늘어난다. 이를 판매할 영업력이 부족해 대부분 기초화장품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도 드물다. 지역의 상떼화장품 등 일부를 제외하면 매출 100억 원을 넘기는 기업도 좀처럼 찾기 힘들다. 한때 부산 화장품 업계의 상징과도 같았던 아마란스도 연간 매출액이 80억 원대에 머무른다. K-뷰티 발원지로 알려진 올리브영과 같은 화장품 편집숍에서도 부산 기업 화장품을 찾기 어렵다. 기업들이 피부관리실이나 병원 납품에 집중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한 업체 대표는 “피부관리실 등에 영업하기에도 벅차,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확대 등의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K-뷰티 붐은 미국 중국과 같은 기존 주력시장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물론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등에서도 거세다. 그러나 기획력이 받쳐주지 않는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에 10개 부산 기업이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기회로 화장품 업계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부산을 찾는 외지인 1억5000만 명 중 외국인 관광객은 300만 명에 육박하는데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 산업이 못 큰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업계가 그토록 바랐던 수출 시장 다변화 시대가 온 만큼 마케팅 역량을 올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해 부산의 자연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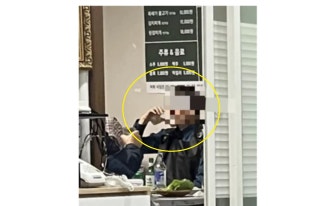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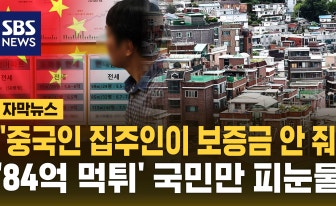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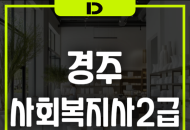



.jpg?type=nf190_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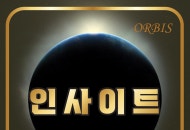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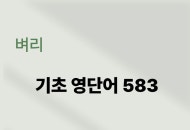


.png?type=nf190_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