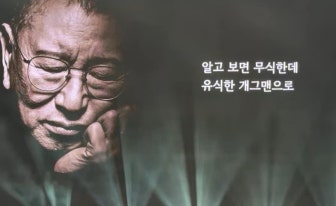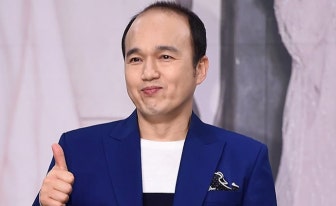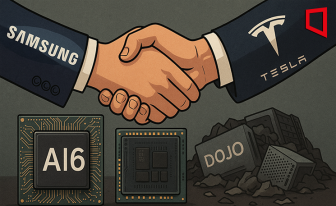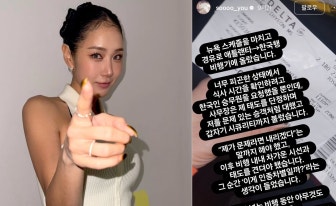교육부가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도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처음 조사했다.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들의 디지털 문해 능력을 1~4 수준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 1’은 전 국민의 8.2%(약 350만 명)로 추정됐다. 17.7%는 기본 조작은 가능하나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수준 2’였다. 전체의 25.9%가 은행 앱으로 송금하기, 키오스크 주문 등 일상적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문맹’이라는 의미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응답자 중 23.3%가 ‘수준 1’이었고, 37.8%는 ‘수준 2’였다. 고령층 61.1%가 일상 속 디지털 기기 조작을 못하거나 미숙하다는 이야기다. 또 도시보다는 농어촌 거주자가, 학력·소득이 낮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 디지털 문해 능력이 낮았다.
기차·버스표나 야구·콘서트 등 여가·문화 관련 티켓 판매나 금융 거래가 대부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다 보니 디지털 기기 취약 계층은 생활 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는 정보 접근 불균형, 경제적 기회 제한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차별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기기 확산은 거스르기 힘든 물결이다. 디지털 문맹은 개인 능력보다는 교육과 기회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디지털 문맹 해소는 고령화 시대 필수적인 사회 대책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글씨 크기를 키우고 화면 구성과 조작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높일 방안도 필요하다.
이은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