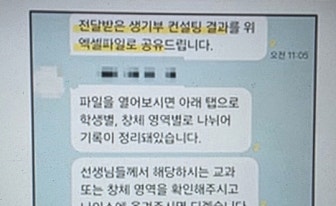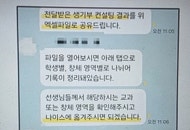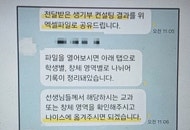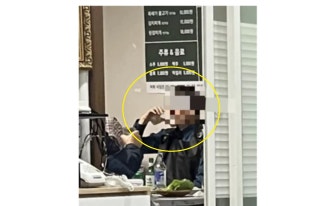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6.25)을 끝낸 협정을 싸고 논란이 존재한다. 당시 협정에 서명한 사람은 유엔군총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펑떠화이 3명이었다. 이 협정서의 armistice라는 단어를 중국어와 한국어(북한) 버전에는 '정전(停戰)'이라고 적었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한국 번역본은 '휴전(休戰)'이라고 해석했다.
휴전(Ceasefire)은 잠시 전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포로를 교환하거나 부상자를 수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전은 넓은 범위에서 상당 기간 전투를 전면 중지하게 된다. 정전을 바탕으로 전쟁을 완전히 중단하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6.25 당시 한국 정부는 통일을 주장하며 서명에 불참했고, armistice를 전쟁이 끝난 정전이 아닌 휴전으로 해석하여 북진통일의 희망을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변곡점을 맞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종전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트럼프는 러시아 푸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따라 만남을 가졌고, 19일에는 메르츠 독일 총리 등 7명의 유럽 정상과 회담을 열었다.
러-우 양국은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 등에 대한 처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등을 싸고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은 낮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주의 대부분을 장악한 데다, 시간이 갈수록 돈 많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서방언론들은 종전·휴전·평화협정이라는 표현을 두루 쓰고 있다. 사실 어떻게 되든 실현 여부는 러시아에게 달려 있다. 휴전이든 정전이든 힘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 우크라이나는 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민 69%가 '협상을 통한 종전'을 원한다고 한다. 3년전 22%보다 3배 넘게 늘어난 수치이다. 오랜 전쟁으로 고통을 겪어온 탓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종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