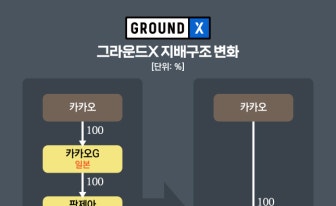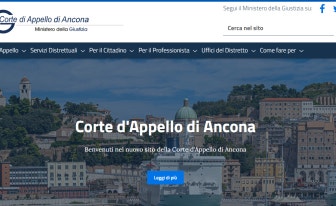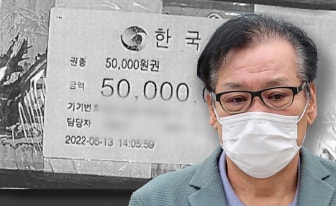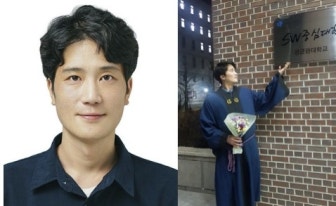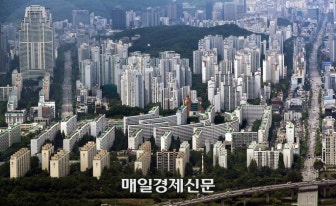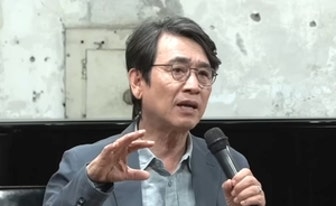경쟁력 약화한 K뷰티…시장 다변화 추진
제품력 강화 집중…파트너사와 역할 분담
중국 패션 시장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K패션 브랜드에게 '뚫리지 않는 벽'과도 같았다. 실제로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운영하는 '에잇세컨즈'와 패션그룹형지 계열사인 형지I&C의 '예작', '본지플로어' 등이 잇따라 중국 진출과 동시에 쓴맛을 봤다. 여기에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후 패션업계와 화장품 업계의 대응 전략은 엇갈렸다. 먼저 화장품 업계는 '탈중국'을 가속화했다. 그 대신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했다. 반면 K패션은 K뷰티의 뒤를 잇는 '제2의 한류 성장축'을 꿈꾸며 중국 시장에 계속해서 도전장을 던졌다.
패션업계는 이 과정에서 '로컬라이제이션(현지화)'을 꾀했다. 이전까지는 국내 기업이 직접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이른바 '직진출'이 일반적이었다. K뷰티도 그랬다. 하지만 직진출은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쉽지 않은 데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 사드와 같은 대외 변수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패션업계는 현지 사정에 밝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체적인 사업 운영을 위임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전개하는 코오롱스포츠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코오롱스포츠는 연구·개발(R&D)과 제품력 강화에 집중, 파트너사는 영업과 현지 마케팅을 맡고 있다. 이런 역할 분담 덕분에 코오롱스포츠 차이나의 매출은 2021년 1800억원에서 지난해 7500억원으로 급증했다.차이나 드림?
업계는 K뷰티와 K패션 간 상반된 행보를 산업 구조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패션은 라이선스나 합작 형태로 진출해 철저한 현지화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화장품은 여전히 'K'가 가진 이미지,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제품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한국 브랜드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패션은 자체 단독 매장의 비중이 높아 현지 맞춤형 운영도 용이하다. 면세점과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등 외부 유통 채널에 의존하는 화장품과 달리 매장 운영을 통해 직접 소비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또 디자인과 아이덴티티가 중심이 되는 패션 산업의 특성상 현지 브랜드와 차별화를 시도하기 수월하다는 점도 경쟁 우위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K패션을 바라보는 중국 소비자들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역시 호재다. 1020세대를 중심으로 K패션 특유의 트렌디함과 개성을 선호하는 현상과 디지털 채널을 통한 제품 정보, 스타일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내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3곳(명동·한남·성수점)의 외국인 매출 중 약 22%는 중국인이 차지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K뷰티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모두 지켜본 만큼 해당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지 맞춤형 전략 수립에 공을 들였을 것"이라며 "K패션을 통해 중국 시장이 다시금 한류 산업의 성장 무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