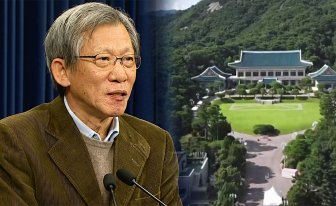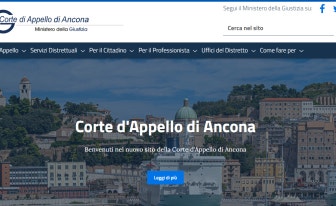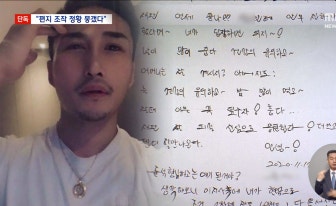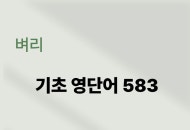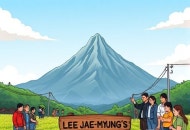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 청정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마련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융합발전은 태양 같은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상에서 구현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주로 토카막이라는 도넛 모양의 장치 내부에 1억℃가 넘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어 핵융합을 일으킨다. 탄소배출이 없고 이론상 발전 효율이 매우 높아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다.
핵융합에너지는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데이터센터 등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핵융합로 소형화를 통해 실증을 서두르고 있다. 2050년대 전력 생산이 목표인 기존 초대형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보다 계획을 앞당겨 2030~2040년대에 전력 생산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국제 환경변화를 반영해 상용화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상용화 핵심 기술을 크게 '소형화 기술 고도화', '전력생산 기술 확보'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4개씩 총 8개 기술을 2035년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핵융합로 소형화는 고온초전도체 자석 기술 개발과 사양 변경에 따른 설계와 부품 원천기술을 개발·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올해 5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플라즈마 과학 및 핵융합 센터(PSFC)와 고온초전도 도체 및 자석 설계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플라즈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제어하고 시뮬레이션 등으로 운전을 최적화하는 노심 플라즈마, 고성능 플라즈마를 구현하는 고출력 가열 및 전류 구동 장치, 초고열 플라즈마로부터 진공 용기를 보호하는 혁신형 디버터 등이 소형화 핵심기술로 제시됐다.
소형화 기술과 비교해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인 전력생산 기술 분야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한 고에너지 입자를 통해 전기 생산을 위한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인 증식 블랑켓, 핵융합로의 극한 환경을 버틸 핵융합 소재가 핵심기술로 꼽혔다.
핵융합 반응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료인 삼중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순환시키는 연료 주기 기술, 핵융합로 특성을 고려한 안전과 인허가 분야도 중요하다.
정부는 민관 협력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과 개발된 기술을 시험하고 실증하기 위해 필수적인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2035년까지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단계별 기술개발 이정표를 제시했다. 미확보 인프라의 경우 해외 연구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용화 준비를 위한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핵융합 인력 양성 강화도 주요 이행 계획으로 소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로드맵 주요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핵융합 분야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추진 방향과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핵융합은 인류가 꿈꿔온 궁극의 청정에너지"라며 "산학연과 국민의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