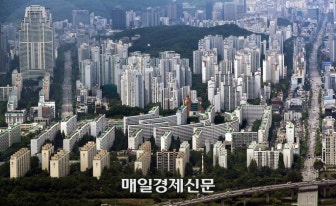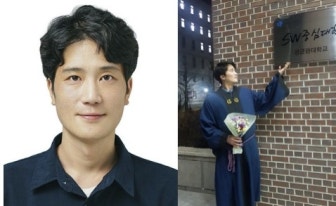KAIST는 조광현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팀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세포 상태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약물과 유전자 표적을 탐색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시스템(Cell Systems)’에 15일 공개됐다.
연구팀은 이 공간에서 세포의 상태와 약물의 효과를 각각 분리하고 이를 다시 조합하는 수학적 모델링 방식을 통해 실험하지 않은 세포-약물 조합의 반응을 예측했다. 이렇게 하면 세포가 특정 약물에 노출됐을 때 어떤 분자 변화를 일으키는지, 나아가 어떤 유전자를 조절해야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연구팀은 실제 대장암 세포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검증했다. 그 결과 AI가 암세포를 정상 세포와 유사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유전자 표적을 찾아냈다. 실험에서도 해당 유전자를 억제하자 암세포의 증식이 줄고 정상 대장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턴이 회복됐다.
조광현 KAIST 교수는 이번 기술에 대해 “특정 약물이나 유전자가 세포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반응까지 예측할 수 있는 범용 AI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세포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암 치료뿐 아니라 손상된 세포를 복원하거나 새로운 약물 후보를 설계하는 데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고자료>
-doi.org/10.1016/j.cels.2025.10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