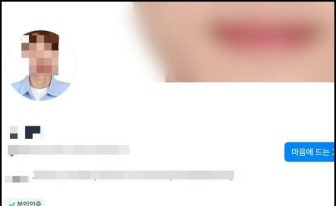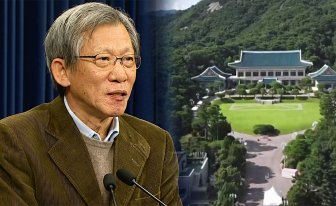미국 하버드대·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대(UCSF)·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 연구팀은 94명을 대상으로 ‘휴가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016년 공개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트랜슬레이셔널 사이키아트리(Translational Psychiatry)’에 실렸다.
참가자들은 리조트에서 6일간 명상하거나 단순히 쉬었다. 혈액 검사 결과 휴가 전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반응과 만성 염증 관련 유전자가 억제되고 세포 회복을 돕는 유전자는 활성화됐다. 흥미로운 점은 명상에 참여한 그룹뿐 아니라 휴식만 취한 그룹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참가자의 혈액을 휴가 시작 전, 휴가 직후, 그리고 한 달 뒤 총 세 차례 채취해 변화를 추적했다. 단기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일부가 한 달 뒤에도 유지됐다.
이런 발현 변화를 지표화해 ‘휴가 효과 점수’를 만들었다. 이 점수만으로도 휴가 전후 혈액 샘플을 96% 정확도로 구분했다. 그만큼 변화가 뚜렷했다는 의미다.
● 가을이면 켜지는 면역 스위치
2015년 존 토드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팀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다. 계절에 따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영국, 미국, 아이슬란드, 호주, 감비아 등 16개국 1만6000명의 혈액과 지방 조직에서 추출한 RNA 데이터를 분석했다. 총 2만2822개 유전자 가운데 23%인 5136개가 계절에 따라 발현 양상이 달라졌다.
특히 북반구 가을철인 9~10월에는 항염증 유전자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했다.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 몸은 다가올 겨울 감염병에 대비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한다. 남반구인 호주에서는 정반대 패턴이 나타났다. 여름철인 12~2월에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계절적 면역 변화는 전 세계 공통 현상인 셈이다.
연구팀은 계절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유전자가 면역, 염증, 대사와 관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에 독감 같은 감염병이 늘어나고, 심혈관질환이나 류머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이 악화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 이번 추석, 몸속 변화의 황금 타이밍
7일 연휴는 하버드대 공동 연구에서 확인된 ‘6일 휴식 효과’를 충분히 넘어선다. 게다가 10월 초는 항염증 유전자가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기다. 긴 휴식과 계절적 면역 강화가 동시에 맞물리는 드문 기회다.
과학이 말하는 조건은 단순하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짜로 쉬어야 한다. 이번 추석은 몸이 스스로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셈이다.
<참고 자료>
doi.org/10.1038/tp.2016.164
doi.org/10.1038/ncomms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