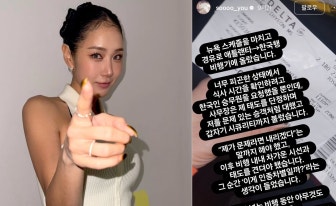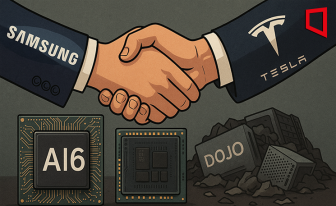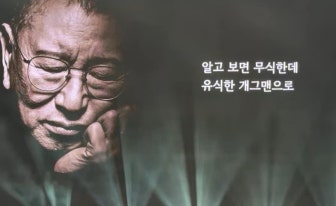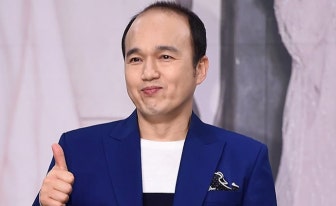[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 인터뷰]
미군 항공기 한국에서 고쳐 바로 투입
동맹의 새 협업 RSF, K방산의 먹거리
시누크 헬기 이어 F-16 전투기로 확대
무기는 도입비보다 유지비가 더 들어
"고부가가치 산업" 국내 기술력 입증
동맹 현대화, 대미협상 카드로도 활용
편집자주
주요 이슈에 주저 없이 끼어듭니다. 핵심 인물을 만나 해법을 묻습니다.미군 항공기가 고장 나면 한국이 수리하는 동맹의 전례 없는 협업이 시작됐다. 주한미군 시누크(CH-47) 헬기가 스타트를 끊었고 F-16 전투기가 바통을 이을 전망이다. 이른바 ‘지역 유지보수 프레임워크(RSF)’다. 전장에 투입되는 미군의 육해공군 전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본토로 보내지 않고 동맹이나 우방국에 맡겨 고치는 새로운 방식의 글로벌 군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수출에 이어 K방산이 도약할 또 다른 먹거리를 찾았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결속과 현대화에 속도를 낼 견인차로 꼽힌다.
한미 RSF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예비역 육군 준장)은 19일 본보 인터뷰에서 “미국은 자국 전투기나 헬기의 엔진을 제3국에서 뜯은 적이 없다”며 “핵심부품은 자신들이 직접 정비한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깬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국내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난달 시누크 헬기를 선정했고, 연말쯤 F-16 전투기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우리 측과 협의하고 있다. 미국의 맹방인 일본, 영국도 못 한 일이다. 미 대표단은 최근 거제, 창원, 울산, 구미 등지를 돌며 주요 기업 실사를 마쳤다.
무기 구입보다 정비가 돈 더 들어... "이만한 고부가가치 산업 없어"
미국은 왜 기존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RSF에 의욕적일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파손된 서방의 무기를 미국이 도맡아 정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부품 체인이 무너져 군용기 가동률은 10% 이상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이 군수관리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불확실한 공급망, 지역분쟁 증가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동맹국의 방산·군수 역량을 활용한 MRO 산업의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무기비용의 30~40%는 도입, 60~70%는 MRO가 차지한다. 고가의 장비를 최소 20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고칠 게 많다. 무기 판매국보다 RSF에 참여해 정비하는 국가의 이윤이 월등한 셈이다. 그는 “무기를 만드는 건 재료비가 엄청 많이 들지만 고치는 건 기술로 한다”면서 “우리에게 이만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기술력이 입증되면 주한미군을 넘어 장기적으로 인태지역의 미군 무기까지 추가로 맡을 수 있어 MRO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덧붙였다. 헬기는 시누크, 전투기는 F-16을 신호탄으로 미군 장비 MRO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트럼프도 바이든 따랐다... "RSF는 美 국방분야 유일한 정책 계승"
다만 한국과 이처럼 이익을 공유하는 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 어긋나 보인다. 이에 대해 이 관리관은 “자동차는 연간 수천만 대를 새로 만들지만 F-16 전투기는 전 세계에 2,000여대 밖에 안 된다”면서 “미국이 사업성이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국방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이어받은 게 RSF”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RSF 참여는 ‘동맹 현대화’에도 긍정적이다. 군수정비 협력을 통한 한국의 기여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는 “관세협상에서 조선 협력(MASGA)을 강점으로 활용했듯 한국의 우수한 방위산업 기반과 뛰어난 기술력도 마찬가지”라며 “RSF로 대미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62146000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