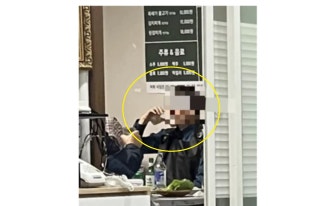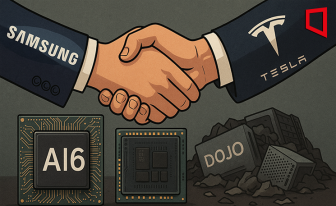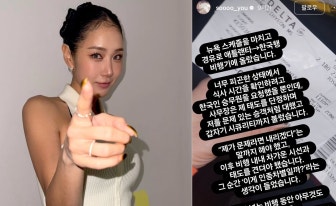비핵화 역할 저버린 中 한계 뚜렷
美 공조 우선… 방중 앞서 방한을
편집자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는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웬만하면 남는 장사다. 뭐가 됐든 굵직한 성과를 내는 터라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건희 리스크가 겹쳐 외유성 이벤트로 지탄받은 윤석열 정부는 이례적인 경우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발언이 반갑다.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 한다.” 미국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의욕을 보였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응당 그래야 하는 일이다.
반대로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다. 2015년 9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톈안먼 성루에 올라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섰다. 자유진영이 보이콧한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지켜봤다. 전례 없는 파격이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같은 화면에 잡혔다. 김정은 대신 참석한 최룡해는 멀찍이 떨어져 보이지도 않았다. 북한을 밀쳐낸 한국 외교의 완벽한 승리로 비쳤다. “한중관계가 이보다 좋을 수 없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중국이 군사력을 과시하고 체제를 선전하고 공산당 위상을 높이려는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조연을 자처했다. 오해와 우려를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미국만 바라볼 수는 없어 ‘중국 역할론’에 기대를 걸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호응하는 시 주석의 원론적 언급에도 열광할 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들었다.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체가 곧 드러났다. 전승절 이듬해인 2016년 북한은 연달아 4, 5차 핵실험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경악했던 3차 핵실험은 맛보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 폭주를 방관했다. 되레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걸고 넘어지며 한국을 짓눌렀다. 양국 교류를 교묘하게 막고 우리 기업을 내몰았다. 대중외교의 처참한 실패였다. 한국을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치켜세우다가 안면을 바꾸고는 선의를 매몰차게 걷어찼다. 한중관계는 그때의 충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10년이 지났다. 중국은 전승절 초대장을 다시 보냈다. 이 대통령이 응하려면 그만한 명분과 실익이 있어야 한다. 비핵화는 여전히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다. 반면 중국은 대북 지렛대 역할을 사실상 저버린 상태다. 시진핑과 푸틴의 두 달 전 회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갈수록 고조되는 핵 위협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북한을 두둔하며 대북제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그들과 만난다 한들 성에 차는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다.
가뜩이나 동맹을 흔드는 미국에 또 다른 빌미를 주는 것도 문제다. 관세를 틀어쥐고는 여차하면 주한미군을 빼겠다며 방위비를 더 내라고 닦달하는 상황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경제와 안보를 저울질하지 말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엔 10년 전보다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다. 미국에 끌려가는 처지가 내키지 않지만 굳이 중국과 의기투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이 대통령이 먼저 중국에 가야 시 주석이 답방한다는 논리는 굴욕적이다. 그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올 수밖에 없다. 집권 이래 매년 빠짐없이 참석한 행사다. 더구나 중국은 차기 회의 개최국이라 불참하기 어렵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가 넘는 21개국 정상들의 모임을 외면하면 중국 손해다. 우리 대통령이 저자세로 연거푸 중국에 다녀온 문재인 정부나 서로 방문을 재촉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윤 정부 때와는 다르다. 정부가 수위를 낮춰 우원식 국회의장 참석 쪽으로 방향을 튼 건 다행이다. 9월 전승절은 저들의 잔치로 남겨놓자. 이 대통령 방중은 APEC 이후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