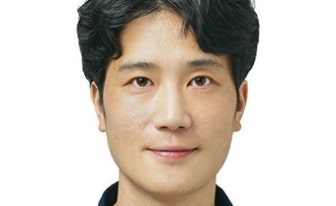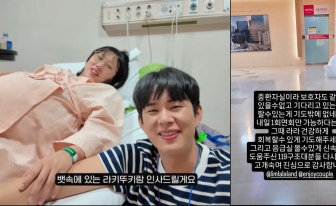극단 이념 유입 공포…기본권 확대 측도 '신중론'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면서 교사들의 오랜 염원이 현실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다만 학부모의 우려는 여전하다. 최근 격화된 정치적 양극화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의견수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사·교장·교감,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해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정치인 후원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일반 시민보다 정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된 셈이다.
특히 선거철엔 더 위축된다. 교사들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와 관련한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를 수 없다. 교사 신분도 포기해야 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직을 내려놨다.
교원단체에선 이 같은 제약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평등권에도 어긋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7개 교원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선언하고,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도 힘을 싣고 있다. 정치·교육·시민사회 인사 144명이 참여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시민사회 원탁회의'에서는 지난 21일 "늦어도 12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할 수 있게, 늦어도 내년 2월 정기국회까지는 국민 여론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국회도 응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선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10월 국정감사 이후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기본권 확대를 주장하는 측이 '학교 밖에서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나, 학부모들은 법 개정이 교실 안으로 극단의 이념이 유입하는 계기가 될까 봐 우려한다. 특히 최근 정치 성향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진 상태다.
정치기본권 확대를 주장하는 측도 이 같은 의견을 공감하는 분위기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사회가 양 끝으로 갈라져 혐오의 정서가 양산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당원이면서 선거운동에 나갈 경우 중립적인 교육이 가능할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교총은 기본권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권리의 범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교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를 더 맞춰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사들이 헌법적 가치나 주요한 교육적 정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 많은 법률적 논쟁이 있어 바람직스럽지 않았다"며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되, 기본권 수준의 문제는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