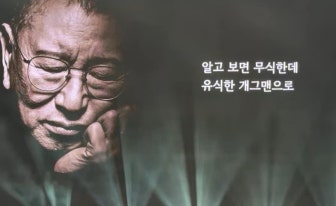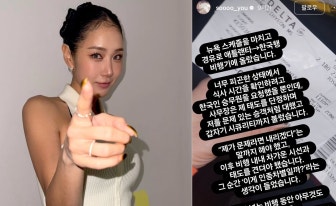그러나 전국 곳곳의 봉안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부산은 2033년이면 실내 봉안시설이 모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종시의 은하수공원도 2032년께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38.5%였던 전국 화장률은 2024년 94%로 치솟았다.
유성원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대표는 “공설 봉안당은 취약계층의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인프라로, 사설 봉안당은 일반 시민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민간 산업 영역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모든 계층이 공설 봉안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은 산업을 위축시키고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시·군 단위로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공설 봉안당 규모가 충분하면 추가 시설 인허가를 제한한다. 서울 및 수도권에는 공설 봉안당이 거의 없어, 상당수가 지역의 사설 봉안당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유 대표는 “사설 봉안당은 지역 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광역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수도권의 봉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장례서비스를 초고령사회의 내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이범수 교수는 “지자체가 사설 공급을 억제하는 이유 중 하나도 자연 경관 훼손과 관리 부담에 대한 우려”라며 “자연장·산분제 등 친환경 방식으로의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례 문화의 변화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요즘 세대는 종교적 신념이 약하고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관념도 달라, 향후 화장 후 산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을 늘리는 것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