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노인이 손을 잡고 오르막길을 걸어갔다.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 김영식씨(70)와 김윤선씨(66)가 서로를 알아봤다. “말투가 그대로네, 너 별명이 맴맴이었잖아. 선감도 나와서는 인천 연안부두 앞 횟집에서 회 뜨는 거 배우지 않았냐.” 50년도 훌쩍 지난 기억이 둘 사이를 오고 갔다.
9월27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옛터에서 ‘선감학원 추모제’가 열렸다. 선감학원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가 운영한 아동 강제수용소다. 아동 5759명이 거쳐 갔다. 대부분 7~17세였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굶주림, 성폭력에 시달렸다. 희생자 시신 150여 구가 암매장됐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원생 당시 다니던 옛길을 걸었다. 선감나루터를 지나, 뱃사공이 머물던 집에서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쌀자루와 연탄을 한아름 안고 나르던 ‘눈물고개’로 올라갔다. 그 고개 중턱의 축사 터 앞에서 이주성씨(65)가 걸음을 멈췄다. 축사 옆에서 생활하며 돼지 새끼를 받아내는 일을 했던 이씨는 14살 때 이곳에서 목을 매달아 죽으려 했다. “지옥에 가더라도 이곳에서 보낸 5년보다 낫다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한 시간 남짓, 오래됐지만 선명한 기억들이 그 길 위에 흘러나왔다. 소년들이 맨손으로 땅을 파서 심은 소나무와 밤나무 씨앗은 이제 울창한 숲이 됐다. 노인이 된 소년들은 자신이 일궈낸 숲 앞에서, 먼저 간 친구들을 위해 위령제를 지냈다.
제사상 앞에서 초대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을 지낸 고 류규석씨(1955년생)의 아내 장인례씨(72)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 생전 그의 가게에서 두세 명이 모이던 자리에 이제 300여 명이 함께한다.
이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왔다. 9월12일, 법무부는 피해 생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했다. 지난 8월에는 피해 생존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동시에 이주성씨는 발굴된 유해 187기를 선감학원 공동묘역이 아닌, 10평 남짓한 공동묘지에 안치하겠다는 계획에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경기도는 9월27일 추모제 당일에 열린 피해 생존자와의 간담회에서 기존 안치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제에서 이 여정을 담은 연극이 무대에 올랐다. 극단 소년단원 박성기씨(60)가 류규석씨가 되어 말했다. “다른 동무들의 몫까지 잘 살아줘. 우리 이야기를 계속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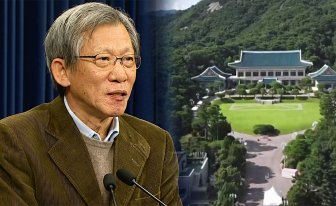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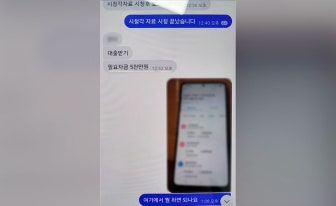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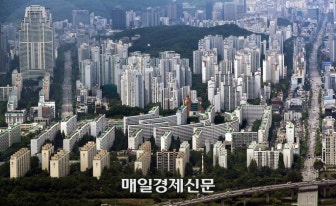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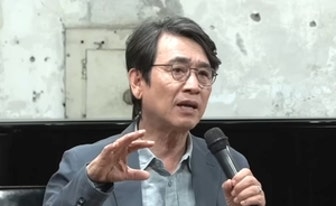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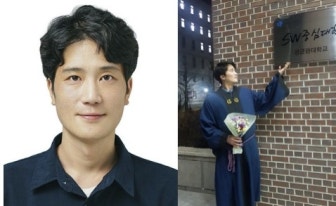







.jpg?type=nf190_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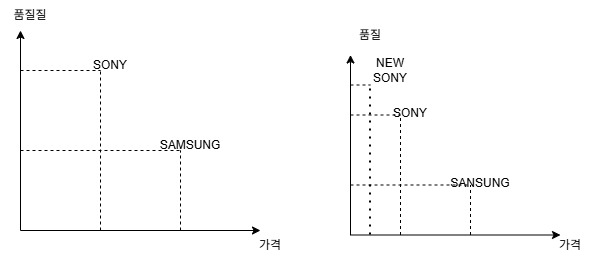.jp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