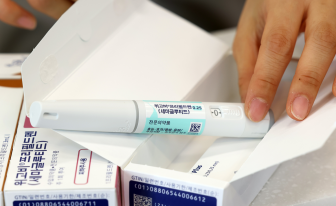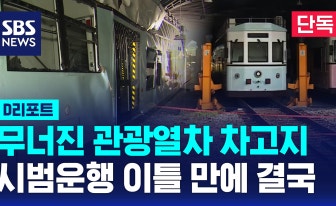추석 연휴에 경복궁을 지나다 한복 차림의 외국인들을 봤다. 빛깔 고운 한복들 중 낯선 모습이 섞여 있었다. 위아래 온통 검정색인 한복이었다. 갓까지 쓰고 있어 이색적이라 자꾸만 돌아보게 되었다. 한복 대여점을 지나다 그 차림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나오는 ‘사자보이즈’ 한복이 있다고 광고하는 글이 붙어 있었다. 저승사자 복장이었다.
〈케데헌〉의 글로벌 흥행을 분석한 기사를 쓴 지 한참 되었는데도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기사를 쓸 때만 해도 혹시 마감 직후 〈케데헌〉 OST의 미국 빌보드 순위나 넷플릭스 순위가 내려가지 않을지 계속 체크해야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관련된 기사 제목들에는 ‘또 1위’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넷플릭스 누적 시청 3억 회를 기록해 역대 최다를 돌파한 지도 오래다.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힘입어 역대 최다 방문자 수를 돌파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제2회 ‘국중박 분장대회’도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케데헌〉 붐의 초창기만 해도 한국적 요소로 가득한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흥행을 기록해 1조원 이상 수익을 얻는 데 비해 한국이 얻는 이익은 ‘0원’이라며 자조하는 기사가 나왔다. 그런 지적들이 의아했다. IP(지식재산권)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건 관광 수익뿐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그것만 따져도 어마어마하겠지만, 과연 그뿐일까? 미국에서 〈케데헌〉을 따라 컵라면을 먹다 화상 입는 어린이가 증가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게 문화의 속성이라고 말한 한 평론가의 말이 떠올랐다. 〈케데헌〉의 매기 강 감독처럼 한국계를 포함한 더 많은 외국인 창작자와 외국 자본이 한국 문화를 소재로 더 자유롭게 다양한 작품을 만들 때 케이 콘텐츠의 가능성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연휴 마지막 날, 동네에 새로 생긴 인형 뽑기 가게에 들렀더니 〈케데헌〉에 나오는 더피 캐릭터 인형을 뽑으려는 인파로 붐볐다. 줄 선 아이들의 부모가 연이어 카드 결제하는 걸 지켜보며 또다시 콘텐츠의 힘을 실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