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르 파누 지음 강병철 옮김
알마 펴냄
668쪽짜리 두꺼운 의학 역사책을 읽으며 울고 웃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의학이 발견한 것은 병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다’라는 책 소개 글처럼, 의학이 궁금해서 읽었지만 결국 책에서 읽어낸 것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현대의학이 만난 결정적 순간과 쇠락기를 오직 팩트라는 근거로 촘촘하고도 아름답게 풀어낸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돼 있지만, 내용은 크게 번영, 쇠퇴, 나아갈 길이라는 세 부문으로 나뉜다. 1부의 12가지 장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의학의 급격한 번영기를 압축해 설명한다. 현대 치료 혁명의 두 축인 페니실린과 코르티손이 얼마나 우연히 발견되고 병의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사용되는가를 보라. 그런가 하면, 아픈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하에 수없이 개심술을 도전하던 의사 존 기버의 집념은 어떠한가. 실패로 끝나버린 마지막 수술에서 18개월 아기의 멈춰버린 심장을 보고 속수무책으로 좌절하는 모습은 가슴을 저리게 한다. 페니실린 발견 이후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역사를 더듬어가며 인류의 위대함을 체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과학자들의 모습 때문이다.
번영 부문만 보더라도 훌륭한 책이지만, 이 책의 압권은 그 뒤 내용에 있다. 고작 50년이라는 짧은 번영 뒤, 1970년대 후반부터 의학은 쇠락에 접어든다. 예전처럼 대단한 발견이 더뎌지던 시기, 의학계에 지적 허세와 기만이 등장한다. DNA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든 ‘신유전학’, 치료보다 예방을 강조하다 도리어 질병의 책임을 환자에게로 떠넘겨버린 ‘사회 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사회 이론’에 대해 “‘거대한 사상’에 사로잡힌 이상주의자들은 이를 방해하는 자질구레한 세부 사항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저자의 문장은 대의를 위해 객관적인 팩트와 과학적 통계마저 부정하는 모든 진보주의자에게로 향한다.
냉정해 보이는 저자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의학의 진보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한다. 과거는 더없이 찬란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현재는 초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란한 과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직시하는 것이라고. 그래야만 실낱같은 희망에 눈이 멀거나 지나치게 비관하며 과거 업적마저 부정하는 실패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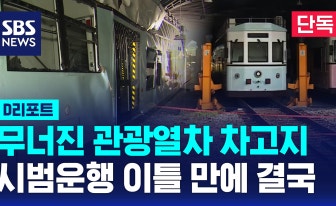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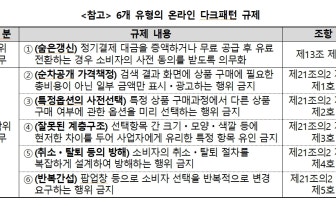








.jp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