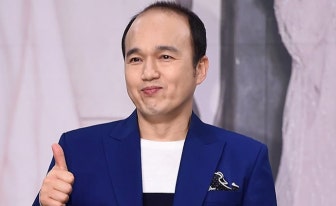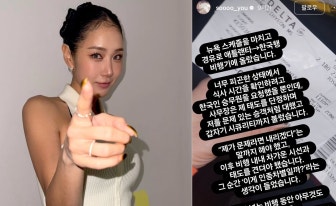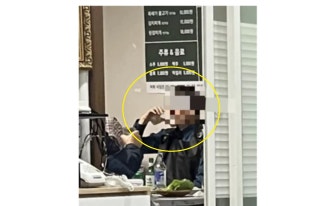TV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송지연 언론노조 TBS 지부장(47)이 ‘콜록’ 하고 기침을 했다. 오래 쓰이지 않아 먼지가 쌓였다. 높은 층고 아래로 프롬프터며 LCD 모니터와 같은 방송 장비가 그대로 있었다. 한때 〈정준희의 해시태그〉 등 인기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곳이다. “기계도 안 쓰면 망가지잖아요. 이거야말로 세금 낭비 아닌가요?” ‘혈세 낭비’는 오세훈 서울시가 TBS 예산 지원을 끊으며 내세웠던 말이다. 8월5일 송지연 지부장이 “놀고 있는” 스튜디오를 소개해주다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ON AIR’ 표시에 불이 켜지지 못한 지 3년째다.
송 지부장은 언론노조 최초의 방송작가 출신 지부장이다. ‘최초’일 수밖에 없었다. 방송작가는 대체로 계약직이라 방송사에 소속되는 경우가 없다. 그 역시 프리랜서로 일하다 2020년 2월 TBS에 입사했다. 당시 TBS가 공공미디어로서 실험을 본격화하던 시기였고,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흐름도 그중 하나였다. 송 작가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에 참여했고 TBS 최초 유튜브 콘텐츠 ‘짤짤이쇼’ 등을 기획·제작했다. “지상파가 가지지 못한 유연성과 방송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정교한 기획력이 만난 플랫폼이었어요. 그 이후 등장한 많은 뉴스형 콘텐츠에 구조적 영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TBS가 굉장히 선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뽑힌 방송작가는 지난 3년간 TBS 정상화를 외치는 최전선에 섰다. 2022년 11월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다.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때만 해도 TBS 탄압이 공영방송 전체로 이어질 거란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언론노조 주류는 대부분 기자인데 저는 방송작가고, TBS도 주류 방송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탄압을 당했어요.” 돈줄이 끊기고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동료들은 떠나는데 조직 안팎으론 침묵과 방관이 느껴졌다고 그는 말한다. “과연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끝일까요? 편향성을 이유로 방송국을 없애려는 시도가 정당한지 더 따져 물었어야 했어요.” 한국 언론사에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송 지부장은 그간의 기록을 담아 책 〈공장폐쇄〉를 냈다. “쓰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라고 한다. ‘언론 탄압’이라는 무거운 주제이지만 자기반성과 상실감, 조직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 이를 위해 분투했던 기록들이 19년 차 방송작가의 언어들로 솔직하게 전해진다. 지난 3년간 좌절스럽기만 했던 건 아니다. TBS가 왜 필요한지,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TBS처럼 조례안 폐지로 돈줄이 끊긴 서울시 공공서비스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TBS가 정상화되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감시하는 지역 언론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싶어요.” 송 지부장이 스스로를 ‘다듬어진 형’이라 말하며 웃었다.
요즘 TBS FM 라디오에서는 음악방송이 흘러나온다. 한때 370여 명이던 인력은 180명으로 줄었고 대다수는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이후로 인건비마저 끊겼지만 ‘TBS에서 계속 방송을 하고 싶다’는 소수의 동료들이 남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조직이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고 송 지부장은 말한다. 오히려 단단해지는 계기였다. 지난 7월 TBS 노동조합과 언론노조 TBS지부가 하나의 노조로 통합된 게 하나의 근거다. 8월5일 KBS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 그래서 누구보다 기뻤다. “이제 TBS 정상화를 논의할 때가 왔습니다.” 텅 빈 스튜디오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날을 송지연 지부장은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