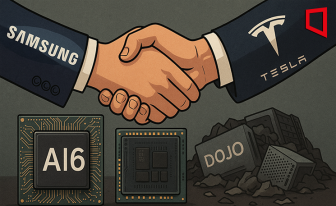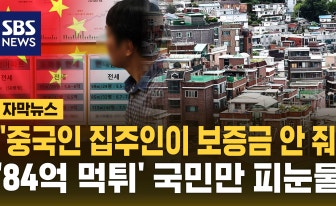“이대로 가다간 곤두박질칠 겁니다. 공영방송의 ‘안락한 망함’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취재원의 격앙된 반응이 전해졌다. 한 언론학자에게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해 의견을 묻는 중이었다. 그는 방송법 개정 논의가 너무 오랜 기간 ‘정치적 독립성’에만 갇히면서 정작 중요한 ‘경영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빠져버렸다며 한탄했다.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시대인데 한국의 공영방송은 십수 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주권을 글로벌 OTT에 다 내어주고 있어요.” K콘텐츠 시대에 공영방송의 자리는 왜 없느냐는 물음이었다.
방송 3법 기사를 쓰면서 머릿속이 적잖이 혼란스러웠다. 분명 언론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인데, 그와 함께 발맞춰온 언론학계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누구보다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이들이다. 언론학자들은 그렇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교하고 엄밀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면 지금보다 정치적 입김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 언론학자는 결국 정치권 단체들의 추천권 행사를 두고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답한다. “언론 자유를 위한 착한 권력은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 3법 수정안이 가장 진일보한 대안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처음부터 완벽한 법은 없고, 개혁의 동력이 충분한 정권 초기에 입법 속도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정부 때 방송 개혁이 좌초된 경험이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보복’이 반복될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이재명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라며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했다. 또 다른 언론학 교수는 “그럴 거면 국민의힘이 방송 3법에 대안을 내놨어야 한다”라고 질책한다. ‘여야 합의’가 좀처럼 만들어지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은 끊임없이 요동치게 될 것이다.
기사를 마감하고도 덜 끝낸 숙제처럼 고민이 이어진다. 방송 3법이 통과된다면 분명 역사적 전환점이 되겠지만 그 출발선부터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공영방송을 둘러싼 ‘보복의 정치’를 이번에는 끊어낼 수 있을까? 영국 BBC 같은 공영방송, 혹은 〈케데헌〉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유능한 공영방송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방송 3법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동상이몽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