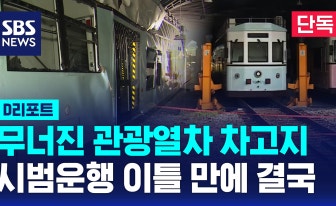우리 아파트 승강기에는 태블릿이 있다. 24시간 광고 영상이 나온다. 29개월 된 아이가 그걸 좋아한다. 신나게 무언가 이야기하다가도 화면을 보면 입을 다문다. 몇 달 전 시작된 ‘개꿀’ 광고가 나올 때면 특히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선글라스를 낀 개구리 캐릭터가 나와 “개꿀~개꿀~개꿀”이라 노래를 불러대는 영상이다. 빈 병을 반납하고 보증금 받으라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홍보 영상이다. 환경부 산하단체라고 한다.
아이가 그 화면에 집중하는 순간마다 참 마뜩잖다. 유아는 스펀지 같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흠뻑 빨아들인다. 알록달록한 캐릭터가 2초에 한 번꼴로 비속어를 내뱉어대는 영상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봐도 되나 싶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태블릿 화면을 끄거나 소리를 줄일 방법이 없다고 했다. 광고 협찬 수익은 아파트 관리비에 보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선 24개월 미만 아동이 어떤 영상 미디어에도 노출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너무 어린 시절에는 멀티미디어를 통해 어떤 지식도 습득할 수 없다. 청소년 SNS와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가 쌓이고 있다. 미디어 중독을 취재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다. 당연히, 모든 위협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다. 좋든 싫든 아이들은 길거리 흡연과 미세먼지, 불량식품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유독 미디어에 대해선 문제의식조차 부족한 느낌이다. 어린아이를 디지털 원주민, 신인류라 상찬하기에 바쁘다.
한국에서는 미디어 과의존이 학벌주의와 사교육의 결과라는 비평에 힘이 실린다. 스마트폰 사용 단속을 ‘공부만 시키는 부모의 억압’이라고도 비판한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같은 문제는 발생한다.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우울해지고, 친구를 만나지 않고, 뛰어놀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 부모가 나쁜 게 아니다. 세상을 뒤덮은 새로운 미디어 자체에 알 수 없는 위험이 내재해 있다.
승강기의 재활용 광고가 입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다. 환경오염 개선에 얼마나 이로울지도 추측하기 어렵다. 유난스러운 사람 취급받을까 봐 더 알아볼 자신도 없다. 부디 막대한 이득이라도 안겨주길 바란다. 부모 죄책감을 담보로 한 거래가 개꿀이 되긴 어려울 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