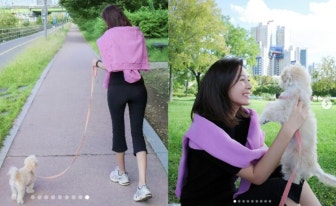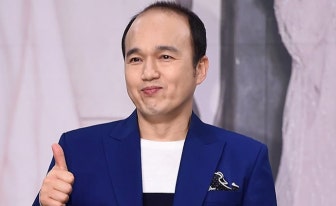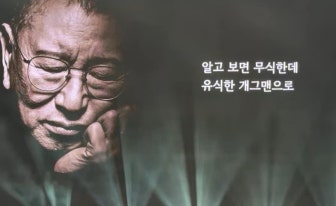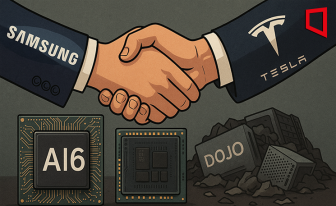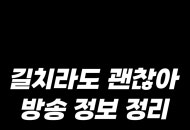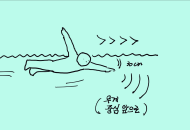일본에서 출항, 부산으로 귀항하는 바닷길에서부터 아팠다. 처음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았다. 만성 소화불량을 달고 살아서 이번에도 갖고 있던 약만 먹고 "괜찮겠지"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식은땀, 게다가 호흡곤란 증상까지.
급기야 위성을 통한 화상전화로 119를 연결했다. 거기서도 별 뾰족한 수는 없었다. 증상을 듣더니 단순 위장장애로 판단했다. 하는 수 없이 육지에 닿을 때까지 가슴을 움켜쥐고 버텨야만 했다.
부산항에 막 접안했으나, 하필 그날이 6일, 추석 당일이었다.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이른 1만t급 컨테이너선 기관장(68)을 대신해 선원 동료들이 119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 응급실의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나왔다. 혈압도 80∼40mmHg까지 떨어진 위중한 상태.
부산 온병원 심혈관센터는 즉시 응급 심장혈관중재술(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다. 집도의는 "좌전하행동맥과 우관상동맥 두 곳이 완전히 막혀 있고, 혈전과 석회가 심하게 쌓여 혈류가 거의 차단된 상태였다"고 했다. 두 혈관이 동시에 막힌 드문 유형의 심근경색.
의료진은 즉각 손목 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넣어 스텐트를 삽입했다. 하지만 시술 중 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류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무혈류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번엔 혈전 용해제를 긴급 투여해 혈류를 회복시켰다.
겨우 바이탈사인(vital sign)이 돌아오고, 두 혈관 모두 정상 혈류를 되찾았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구사일생.
그런데, 만일 그런 응급상황이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했다면?
바다 위, 선박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어렵다. 특히 장거리 항해 중일수록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다.
현행 '선원법' 등에 따르면 원양항해 구역을 운항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상선이나 근해 300톤 이상 어선에는 '의료관리자(선의, 船醫)'가 반드시 승선해야 한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적 외항선은 1172척, 등록 어선은 6만3731척. 이 가운데 의료관리자 의무 대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통상 의료관리자는 의사·간호사 또는 해양의학·응급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지정된다. 선원 건강관리·응급조치·의약품 관리·위생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관리자는 의사보다, 간호사나 교육 이수자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어디에, 얼마나 배치돼 있는지 현황을 집계한 공식 통계도 없다.
법으로 규정된 의무사항도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해상에서 응급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사실 손을 쓰기 어렵다. 또 다른 사각지대다.
해양 전문가들은 "의료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 기준 강화,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고위험군 선원의 건강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선상에서 심한 흉통이나 명치통이 있으면 육지로 즉시 이동하여 심장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와 관련한 시스템이 아직 충분하지도, 완비되지도 않았기 때문.
한 해운업계 관계자도 15일 "의료관리자 제도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응급상황에 대응하기엔 인력과 장비 모두 부족하다"며 "바다 위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격차는 수도권-지방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육상과 바다 사이에도 크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