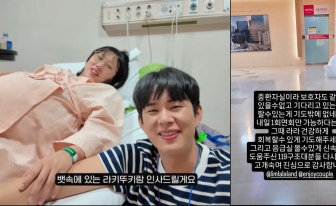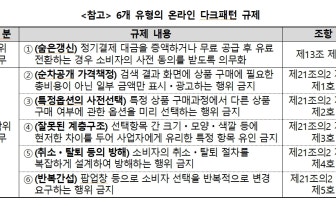서민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 셈으로, 현장의 혼란과 함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규제지역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분류된다. LTV가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규제 적용 이전에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LTV 70%를 활용해 7억원을 대출 받은 뒤, 대환대출을 받는다면 LTV가 40%만 적용돼 3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빌린 차주는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는 대환대출 관련 LTV 예외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고, 신규대출에 LTV를 다시 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등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환대출 관련 정책이 불과 수개월 사이 '막았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6·27 대책 당시 규제지역 주담대 대환대출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했고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지자 소비자 불만과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환대출 실행액은 규제 이전인 5~7월 월평균 1600억원대에서 규제 여파가 반영된 8월 324억원으로 급감했다.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10·15 대책으로 다시 이를 막은 것이다. 6·27 대책에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나온 9·7 대책이 현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다시 규제 체계가 뒤집힌 셈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 은행만 바꾸는 것일 뿐 대출 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서민과 대출 실수요자들의 이자 경감을 바란다는 정책 취지가 희석됐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관계자는 "정책 목표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라면, 대환대출만큼은 합리적 예외와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며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주담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환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