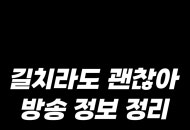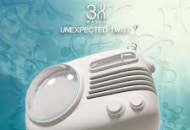시장 안팎에서는 유유제약의 2년 전 영업조직 개편이 실적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업인력을 직접 운영할 때보다 조직의 유연성과 비용통제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정비 비중이 높은 영업조직을 축소하고 수수료 기반의 외주화를 택하면서 비용효율화를 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유유제약의 재무구조는 CSO 체제 도입 이후 좋아졌다. 매출이 2023년 1372억원에서 2024년 1331억원으로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3억6000만원에서 11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순이익도 1년 새 -55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올랐고, 영업이익률도 0.3%에서 8.8%로 높아졌다. 원가율은 64.3%에서 61.2%까지 낮췄다. 지급수수료가 67억원에서 121억원까지 올랐지만 전체 판매관리비를 485억원에서 400억원까지 낮추면서 수치적으로 효율화에 성공했음을 입증했다.
회사의 어려움은 실적에도 반영됐다. 매출은 2021년 1157억원에서 1389억원으로 늘었지만 영업이익 12억원에서 영업손실 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9억원에서 44억원으로, 판관비도 441억원에서 539억원으로 뛰어올랐다. 특히 판관비 중 경상개발비가 40억원에서 86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불어난 R&D 비용이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업계의 시선을 방증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영업조직 리뉴얼에도 '동행'은 계속되고 있다. 해체된 2개 조직에서 종합병원 영업을 희망하는 인력을 해당 부서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으며, 회사는 CSO로 전환한 퇴사자들과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퇴사 전까지 유유제약의 품목들을 영업해본 경험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비용은 절감한다는 복안에 따른 것이다.
'수수료율'도 관전 포인트다. 시장은 5인 이하 군소 업체가 CSO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에 주목한다. 외주화에 따른 불안정 요소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수수료율을 두고 벌어지는 제약사와 CSO 간 협상이 체제 전환의 '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율 평균치가 존재하지 않고, 같은 품목이라도 제약사별로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심지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기간 CSO 측에 수수료로 수익의 100%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2022년 당시 안구건조증 신약의 R&D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지만 임상2상까지 진행됐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접게 됐다"면서 "실적을 흑자로 돌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다 영업구조를 바꿔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병의원·약국 영업조직을 해체하면서 나온 인력들이 직접 CSO를 차려 회사와 계약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CSO를 도입하면 어느 기업이든 영업지배력 저하 우려가 생기지만 유유제약은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