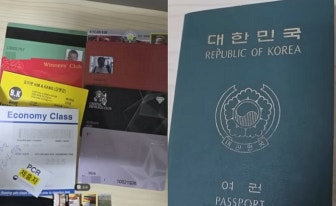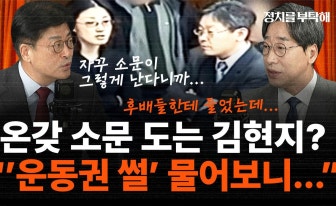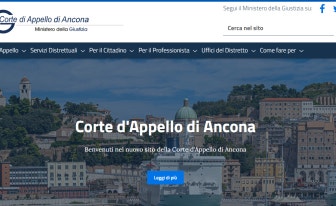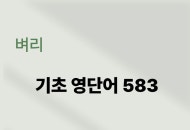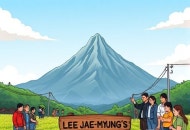구글·퀄컴 손잡은 '삼성 갤럭시 XR', 스펙은 경쟁권…애플·메타 '정조준'
[배태용기자] 삼성전자가 22일 헤드셋형 XR(확장현실) 기기 '갤럭시 XR'을 국내 출시했습니다. 구글·퀄컴과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처음 적용한 제품으로, 음성·시선·제스처를 결합한 멀티모달 AI를 전면에 내세웠죠. 후발주자로서 하드웨어보다 ‘AI형 인터랙션’에 초점을 맞춰, 메타·애플이 구축한 XR 생태계와의 경쟁에 맞서겠다는 복안입니다.
22일 삼성전자는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갤럭시 XR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제품 기능과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XR은 4K 마이크로 OLED(3552×3840), 시야각 수평 109°·수직 100°, 퀄컴 스냅드래곤 XR2+ Gen2, 16GB 메모리·256GB 저장공간, Wi-Fi 7, 무게 545g을 갖췄습니다. 고해상도 패스스루 카메라 2개, 공간·동작 인식 카메라 6개, 안구 추적 카메라 4개를 채택했으며, 일반 사용 2시간(동영상 2.5시간) 수준의 배터리 지속시간을 제시했습니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기업 신고 안해도 정부 조사 가능해진다
[최민지기자] 이제 해킹 정황만 확보되면,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가 현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2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 일련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합니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합니다. 통신사 경우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형기지국(펨토셀)은 즉시 폐기합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기업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단기과제인 만큼,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내 수립할 예정입니다.
AI 반도체 생태계 총출동…제27회 반도체대전 개막 [소부장반차장]
[고성현기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반도체 전시회 '제27회 반도체대전(SEDEX 2025)'이 개막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을 선보입니다. 이날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반도체대전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전시회 주제는 '한계를 넘어, 연결된 혁신(Beyond Limits, Connected Innovation)'입니다. AI 시대에 반도체 산업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생태계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 설계·제조·후공정 전 영역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총 280개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며, 약 6만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전망입니다.
송재혁 삼성전자 CTO "혼자 하는 혁신은 없다…로직의 길, 이제 D램·낸드도 간다" [소부장반차장]
[배태용기자] "29년간 반도체 개발을 하며 느낀 건, 혁신은 천재 한 명이 아니라 다양한 협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최근 반도체 기술의 흐름은 바로 그 '시너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 2025)' '시너지를 통한 반도체 혁신'을 주제로 연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CTO는 반도체 기술 진화의 핵심 키워드로 디바이스 구조의 3D 전환과 첨단 패키징 기술의 융합, 분야 간 협업 확대를 꼽았습니다. 그는 "D램, 낸드, 로직, 패키지 등 모든 영역에서 기술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로직이 먼저 간 길을 이제는 D램과 낸드가 따라가는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수도 어려운 펨토셀”...위협 탐지 자동화 기술 도입이 해답
[오병훈기자]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를 향한 집중 추궁 대상 중 하나는 바로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문제였습니다. 무단소액결제 사태에서 정보 유출 경로 중 하나로 개조된 불법 펨토셀이 지목된 상황 속 지난 17일에는 총 20개 불법 펨토셀이 식별됐다는 KT 자체조사 결과가 나왔죠. KT의 최초 피해 발표 때 식별된 불법 펨토셀 아이디(ID) 숫자는 2개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 수는 10배가 늘었습니다. KT의 하드웨어 인프라 관리체계 부실로 정확한 현황 파악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죠.
국회에서도 KT 관리부실 문제에 대한 성토 목소리가 이어졌습니. 통신사 하드웨어 인프라 관리 부실이 곧 가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면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KT는 유휴 펨토셀 회수 작업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펨토셀 설치 특성상 설치 장소 관계자 협조 없이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펨토셀을 통한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위협 탐지 자동화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22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https://imgnews.pstatic.net/image/138/2025/10/22/0002207545_002_20251022172514340.jpg?type=w860)

![송재혁 삼성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 디지털데일리]](https://imgnews.pstatic.net/image/138/2025/10/22/0002207545_004_20251022172514434.jpg?type=w860)
![[ⓒ 챗GPT 이미지 생성모델]](https://imgnews.pstatic.net/image/138/2025/10/22/0002207545_005_20251022172514489.jpg?type=w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