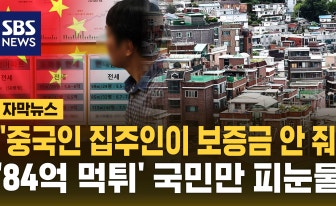[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포스코퓨처엠이 리튬인산철(LFP) 양극재로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공략에 나선다. 타깃은 각형과 파우치형 폼팩터 모두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해외유해국배제법(OBBBA) 개정안에 따른 '탈중국' 흐름 속에서, 공급처가 확정되지 않은 거나 변경해야하는 물량을 모두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8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중국 CNGR, CNGR 한국 자회사 피노(FINO)와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회사는 ▲ESS용 LFP 양극재 생산시설 구축 ▲공동 마케팅 등에서 협력한다.
이번 MOU는 양사(포스코퓨처엠·CNGR)가 2023년 체결한 전구체 합작투자계약(JVA)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격이다. 양사는 지난해 합작사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지분 구조 CNGR 51%·피노 29%·포스코퓨처엠 20%)를 설립, 전구체 생산을 추진해왔다. 이번 합의로 포스코퓨처엠은 LFP 양극재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게 됐다.
포스코퓨처엠이 이 시점에 LFP 카드를 꺼낸 것은 북미 ESS 시장에서 '탈중국' 소재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내 포스코퓨처엠 지분 20%를 통해 생산된 LFP 양극재는 '북미·FTA 체결국 생산'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북미 생산 배터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객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주요 공략 대상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현재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양산, 양극재는 상주리원 등 중국 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OBBBA와 IRA 개정안 발효에 따라 2027년부터는 중국 등 '우려국가'산 핵심광물·소재 비중을 40% 이하로 줄여야 해, 장기적으로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달 테슬라향으로 추정되는 약 5조9442억원 규모의 ESS 수주를 공시한 가운데, 해당 프로젝트는 '각형' 폼팩터로 확정, 투입할 LFP 양극재 공급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MOU를 계기로 이 물량 확보를 노리고 있다.
삼성SDI 역시 북미 ESS 시장 확대를 위해 LFP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에 LFP 마더팩토리를 구축해 시양산을 시작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일부 라인을 ESS 전용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LFP 생산 라인 증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 ESS 시장에서 LFP 점유율은 80%를 웃돌지만, 현지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며 "IRA 개정안 발효 시 대규모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한 만큼, 포스코퓨처엠의 이번 행보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선점 전략"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공장 [ⓒ포스코퓨처엠]](https://imgnews.pstatic.net/image/138/2025/08/11/0002202505_001_20250811154108988.jpg?type=w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