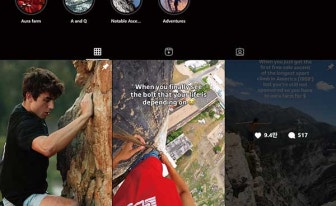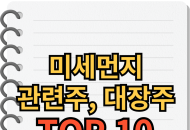그래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두 번이나 다녀왔음에도 마르디히말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았다. 히말라야 트레킹이라고 하면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로 가거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EBC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길은 우리한테 덜 알려져 있을 뿐,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심지어는 본 적도 있었다. 14년 전에 처음으로 ABC를 걸었는데 그때도 오른편에 마차푸차레 아래로 향하는 길을 봤었다. 그 길이 바로 마르디히말 코스였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기대감보다는 다소 담담하게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래도 약간은 설레는 포인트가 있었다. 그건 오스트레일리안 캠프라는 곳을 이번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장소였다. 더불어 아직 덜 상업화돼 붐비지 않는 산길과, 언제 봐도 속 시원한 능선을 따라 펼쳐진 설산, 그리고 가까이서 온전하게 마주하는 마차푸차레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다시 네팔 포카라에 섰다.
칸데Kande(1,770m)~오스트레일리안 캠프~피탐 데우랄리Pitam deurali(2,100m)
이동거리 5.6km, 누적 상승고도 542m, 난이도 쉬움
포카라에서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달린 후 내린 곳은 칸데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었다. 출발지는 그저 도로 한편의 노점 앞이었는데 시작점이라기엔 낯설 만큼 소박했다.
첫 발을 내딛은 지 약 한 시간, 첫 뷰포인트인 오스트레일리안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탄성이 터졌다. 멀리서 바라보는 마차푸차레와 안나푸르나 남봉, 그리고 히운출리가 설경 속에서 우아하게 떠올라 있었다.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아, 오길 잘했네. 오스트레일리안 캠프가 유명한 이유가 있었구나."
첫날 일정은 짧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마음을 완전히 열게 했다. 이후 피탐 데우랄리까지 이어진 길에서 해가 지며 붉게 물든 마차푸차레의 실루엣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완벽한 준비운동이자, 마음의 준비를 마친 하루였다.
피탐 데우랄리(2,100m)~포레스트 캠프(2,200m)~로우 캠프(2,995m)
이동거리 11.4km, 누적 상승고도 1,140m, 난이도 보통
둘째 날의 아침은 일출과 함께 시작됐다. 눈 뜨자마자 카메라 삼각대를 들고 나왔고, 붉은 태양이 마차푸차레를 비추는 그 순간 감동이 밀려왔다. 지금 여기가 바로 히말라야였고 그 말 외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둘째 날은 밀림을 뚫고 고도를 천천히 올리는 제법 긴 코스였다. 숲길은 마치 한국의 둘레길을 닮아 익숙하기도 했지만 중간 중간 펼쳐지는 설산이 네팔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줬다.
오늘의 숙소인 로우 캠프에 도착하자 드디어 3,000m를 넘어섰다. 공기는 차가워졌고 하늘은 더더욱 맑아졌다. 저녁으로 준비된 특별식 백숙은 오늘의 피로를 완전히 씻어 주었다. 요리사가 마늘과 파를 넉넉하게 넣어준 덕분에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백숙을 즐길 수 있었다.
새벽에 잠깐 나가 본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이 쏟아졌다. 그 순간은 말 없이도 충분한 낭만이었다.
로우 캠프(2,995m)~바달 단다Badal Danda(3,300m)~하이 캠프(3,550m)
이동거리 4.1km, 누적 상승고도 596m, 난이도 보통
짧지만 아름다운 하루였다. '구름의 언덕'이라는 뜻을 지닌 바달 단다 때문이다. 바달 단다부터 시작되는 탁 트인 능선길은 이 트레킹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간이다. 멀리 뻗은 마르디히말 능선 위로 하이 캠프와 뷰포인트까지 이어지는 길이 한눈에 펼쳐졌다. 그리고 그 뒤를 우직하게 지키는 마차푸차레의 존재감은 더욱 커져 있었다.
다행히 이날은 날씨가 맑고 깨끗해, 그림처럼 펼쳐진 풍경 속을 걸으며 무사히 하이 캠프에 도착했다. 짧은 일정 덕분에 하이 캠프의 부엌에 둘러앉아 일행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모든 순간이 편안했고 마음이 가볍고 감사한 하루였다.
하이 캠프(3,550m)~마르디히말 뷰포인트(4,300m)~시딩Siding(1,700m)
이동거리 14.1km, 상승고도 506m, 하강고도 2,204m, 난이도 어려움
트레킹 마지막 날이다. 새벽 4시에 기상해 4시 30분에 출발하기로 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였고 다행히 눈이 내리지 않아 아이젠과 스패츠는 착용하지 않고 이동했다. 긴장과 설렘을 번갈아 느끼며 새벽 어둠을 뚫고 출발한 지 약 두 시간 만에 뷰포인트에 도착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드디어 태양이 안나푸르나산군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동안의 수고로움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첫날 오스트레일리안 캠프에서 머나먼 실루엣으로 바라봤던 마차푸차레가 지금은 손에 닿을 듯 눈앞에 와 있었다. 하얗게 펼쳐진 설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들이켰을 때 긴장감은 스르르 풀리고 마음속엔 오직 벅참과 고마움만이 남았다. 힘겹게 오른 만큼 이 순간을 천천히 충분히 누렸다. 그리고 3일로 나눠 올랐던 길을 8시간 만에 시딩마을까지 빠르게 내려오면서 여정을 마쳤다. 하산길은 길고 고단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가볍고 단단했다. 그건 아마 우리가 찾고 싶었던 풍경과 감정이 이미 마음속에 담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월간산 9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