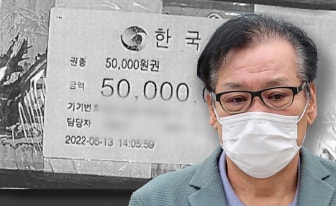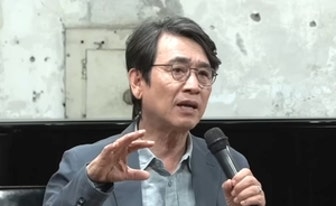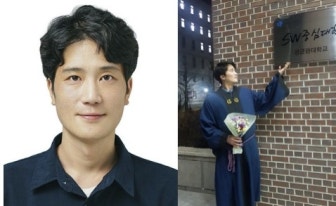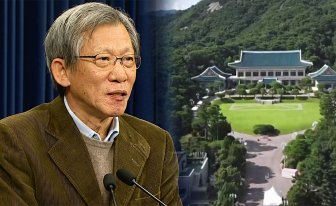PTA 감독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불안과 분열 일상화된 세계의 초상
완결이 없는 혁명, 싸움의 본질은?
우리는 언제쯤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이 질문에 직접 답하는 대신, 우리가 ‘왜’ 계속 싸우는지 근원적인 이유를 묻는다. 영화 제목이 암시하듯 하나의 전투가 끝나면 또 다른 전투가 이어지는 반복의 서사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과 사회적 분열의 고리를 장엄한 은유로 담아낸다. 이 단순한 문장은 분열된 현대 사회 특히 미국 내부의 첨예한 갈등과 분노가 일상화된 세계의 초상처럼 보인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폭발과 추격, 총격전이 이어지는 블록버스터의 외형을 띠지만 이면에는 이념과 인종, 계급의 갈등으로 무너진 사회의 심층이 새겨져 있다. 물리적인 ‘전투’는 오락적 장치가 아니다. 불신과 증오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이념 간의 충돌, 증오가 낳은 사회적 폭력의 일상화를 상징한다. 이때 감독은 스펙터클을 통해 현실의 폭력성을 가리기보다 오히려 이면을 들춰낸다. 그로 인해 스크린 위의 끝없는 폭력은 어쩐지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이는 영화가 가상의 미국이 배경임을 밝히지만, 동시대 미국 내부의 갈등 양상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정치적 작품이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영화는 반체제 단체 ‘프렌치 75’ 소속의 급진 활동가였던 ‘팻’(리어나도 디캐프리오)이 혁명의 실패와 조직의 와해 이후, 술에 찌들어 은둔하는 ‘밥’으로 살아가는 현재를 조명한다. 과거 자유를 위해 폭탄을 만들었던 그는 이제 16살 딸 ‘윌라’의 안전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그에게 16년 전 인물이 찾아오면서 전쟁이 시작된다. 과거 이념적인 투쟁이 이제는 부성애라는 사적인 감정으로 치환된다. 밥의 싸움은 신념과 공포, 사랑과 책임이 뒤엉킨 내면의 투쟁이며,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려는 몸부림이다. 사실 밥에게 자유란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감독은 밥을 통해 혁명가로서의 정당성이 아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신적인 사랑은 동시에 고립을 낳는 역설을 품고 있다. 밥은 외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고자, 세상과 딸을 분리하며 숨어 살았다. 하지만 그가 구축한 안전망은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감옥이다. 그는 자신이 딸을 위해 싸운다고 믿지만 그 방식이야말로 폭력의 논리일 뿐이다. 밥 또한 폭력은 폭력을 낳고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부르는 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권력에 눈이 먼 인물들은 지난한 관계를 후대로까지 이어가며 싸움을 만드는데, 이는 혁명의 완결은 없다는 감독의 시각을 대변한다.
결국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아버지 세대의 싸움이 지닌 폭력적 한계와 그 절망적인 계승을 고백하는 영화이다. 그럼에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희망의 열쇠는 다음 세대인 ‘윌라’에게 있다. 윌라는 아버지 세대가 물리적 전투를 통해 지키려 했던 ‘자유’를 물려받지만, 그 방식을 답습하지 않는다. 윌라는 배타적인 고립 대신 연대와 공존을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는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선택한다. 감독은 이 과정을 마지막 장면에서 절제된 방식으로 제시한다. 윌라가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 밥은 과거의 폭력이나 은둔 대신 오직 ‘조심하라’는 당부를 건넬 뿐이다. 이 고요한 순간 영화는 블록버스터의 소음을 넘어 우리가 해내야 할 싸움의 본질을 암시한다.
결국 영화는 폭력과 갈등이 만연한 세계를 비관적이면서도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그려내지만, 그 핵심에는 ‘우리가 왜 싸우는지’ 근원을 파악하게 하는 통찰을 담는다. 혁명에는 완결이 없지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강렬하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오래도록 남는 영화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