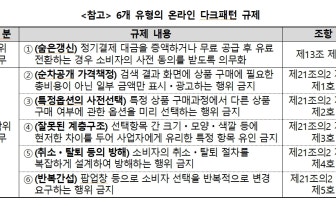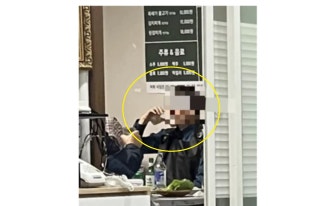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업
한미 관세협상 돌파 일등 공신
국가 안보·첨단산업으로 재조명
자율운항·수소선박 글로벌 경쟁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필요
부산대 국가연구소 탈락 아쉬워
대한민국 조선업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협상의 길을 터 준 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선박 건조 기술이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해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냈고 우리 정부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응답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막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도 조선업은 협상의 파국을 막는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다. ‘조선업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요즘이다.
2025년 현재 우리 조선업은 세계 최고다. 자본도 기술도 없었던 1970년대 500원짜리 지폐 속 거북선과 울산 미포만 백사장에서 시작해 세계 1위의 신화를 이뤄낸 게 한국 조선업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뚝심,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들의 열정이 그 신화의 출발점이었다. 50년 역사 속 풍랑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세계 정상에 올랐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속에 조선소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은 물론이다.
조선업은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이다. 사이클에 따라 패권이 이동하고 그때마다 혁신 기술이 등장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영국은 글로벌 선박 건조의 60%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였다. 두 개의 철판에 구멍을 뚫고 가열한 리벳을 꽂아 접합하는 ‘리벳 공법’으로 100년 이상 조선업 최강자 지위를 누렸다. 영국 템스강 변의 한 카페에서 출발한 로이드선급의 조선 규칙이 현재까지도 국제 기준으로 통용되는 이유다.
리벳을 대체한 게 용접이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블록을 나눠 용접하는 방식으로 배를 붕어빵처럼 찍어냈다. 미국의 군수용 블록·용접 기술을 발전시켜 1960년대 조선업 강자로 부상한 게 일본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조선업이 장기 침체에 빠져들자, 노동집약적 사양산업으로 판단, 구조조정과 표준화에 매달리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국이 그 과정에서 공격적 투자와 현장의 설계·제조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정상에 올라선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조선업이 다시 위기를 맞자,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에 나서 한국도 일본과 같은 운명의 길로 접어드는 듯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업에 재도약의 기회가 됐다. 그 중심에 액화천연가스(LNG)선이 있다. 중국이 물량 면에서 우리를 추월했지만, 고부가가치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기술력을 앞세운 한국이 단연 최고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빛과 그늘이 공존한다. 조선업의 근간인 원천기술은 앞선 유럽 국가들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LNG선의 운반탱크(화물창) 원천기술은 프랑스 GTT사가 독점하고 있다. 국내 조선 3사는 라이센스 비용으로 선가의 5%를 낸다. 2000억 원짜리 LNG선을 만들면 GTT사가 가만 앉아서 100억 원을 챙겨가는 구조다. 2010년대 GTT사가 매물로 나온 적 있는데 국내 조선사들은 원천기술 독점 기회를 놓쳤다. 그 과정에서 중국 자본이 GTT에 유입됐고 GTT를 통해 국내 조선소 현장 기술까지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굳건히 세계 1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뉴노멀을 창조하는 퍼스트 무브가 되는 수밖에 없다. 조선업은 이제 국가의 명운을 건 안보산업이자 첨단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AI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조선소와 자율운항선박 경쟁이 이미 시작됐고 LNG선에 이은 수소선박 전환도 미래 조선업 패권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 조선소의 독은 이미 가득 찼다. 3년 치 일감을 쌓아둬 배가 부른 상태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면 경기 사이클에 쓸려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이다. 미중 해양 패권 경쟁은 세계적 조선업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미국과 일본이 조선업 재건에 나섰고 유럽과 중국도 신기술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마침 정부가 세계적 연구를 선도할 대학연구소 4곳을 국가연구소로 지정해 10년간 1000억 원씩 투자키로 했는데 최종 후보에 올랐던 부산대 초저온연구소가 탈락했다는 소식은 그래서 더 안타깝다. 수소선박과 북극항로 개척 시 선박 환경에 필요한 원천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어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따른 배려 차원에서 사립대 4곳을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더 납득이 어렵다.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운 새 정부 대학 정책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100년 전 ‘바다를 지배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던 알프레드 마핸의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