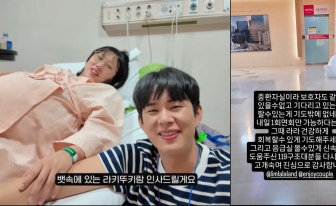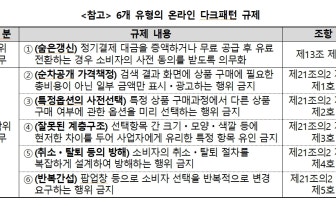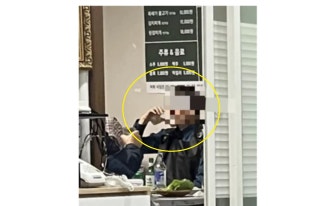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에서 금기어로 여겨졌다. 남한에 대칭되는 북한이 통일을 전제로 한 ‘잠정적 특수관계’를 드러내는 호칭이었다. 하지만 최근 남북 관계 서술에서 ‘조선’ 표현을 마주치는 게 드물지 않다. 현직 언론인이 저자인 신간 〈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사계절)이 그중 하나인데, 시종일관 북한을 조선으로 부른다. 이는 북측의 최근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급변침을 선언한 뒤 우리를 남조선 대신 한국으로 부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 파장이 적지 않다. 정 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국가론’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통일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우선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일반 국민의 인식에서도 ‘북한’과 ‘조선’의 수평이 흔들리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20일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25’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51%로 조사 이래 최고치였다. ‘통일이 필요하다’(49%)는 전년 대비 3.8%P 떨어져 찬반이 역전됐다.
남북 대화는 단절되고 교류마저 끊긴 상태여서 통일이 요원해 보인다. 이 상황은 통일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던 동서독 교착 상태와 흡사하다. 통일을 주도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조차 1988년 “통일(이 된다는 희망)은 평생의 거짓말”이라고 토로했다. 에드워드 히드 영국 총리는 “독일 통일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조롱했다. 구 소련군과 가족 54만 명이 주둔한 위성국가였던 동독 역시 통일에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극적인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독이 동독의 주권을 인정한 채 교류와 신뢰 형성에 꾸준히 노력한 덕분이다. 통일 구호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이점을 호소하고 실천한 것이다.
미중 대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무장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을 패싱한 북미 정상회담도 어른거린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이 배제되고 주변 강대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한반도 어젠다에서 한국 스스로 물러서면 안 되는 이유다. 통일은 과정이어야 한다. ‘북한’과 ‘조선’의 차이를 따지기 전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