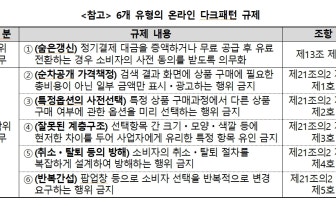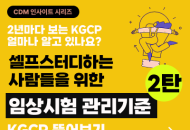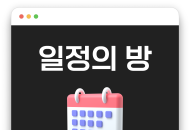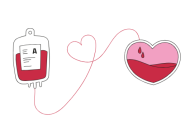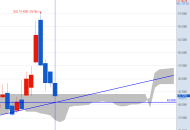장편소설 '희주'로 수상, 무게감 느껴
힘들었던 순간에 대한 다독임으로 생각
을숙도 자연 보면 글 쓸 힘 생겨
미세한 균열의 인간관계 영향에 관심
올해 제42회 요산김정한문학상은 부산 박향 소설가의 <희주>가 선정됐다. 이 소설은 세 사람의 희주를 연결고리로 삼아 기억 속의 상처를 공유하고 치유해 나간다. 이러한 서사는 인간의 상처와 고통을 응시했던 요산 김정한의 소설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올해 요산김정한문학상의 주인공 박향 소설가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수상 소감을 부탁한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작품을 인정받는 증명서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처음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기뻤다. 이 작품을 쓰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던 순간들에 대한 다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요산선생님 이름으로 받는다는 데 대한 무게감이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 무게감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나 스스로에게 주문하고 있는 중이다.
-<희주>는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았던 세 사람의 희주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시켰다는 점이 돋보인다. 구상 단계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썼는가.
“언니 희주가 동생 희주에게 그리고 희주의 딸 유미에게 스며들 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표현하고자 했다. 돌이 지난 언니 아기가 희주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했고, 독자가 그 부분에서 마치 진짜처럼 느꼈으면 했다. 정말 그 아기가 찾아왔다고 글을 쓰면서 매순간 상상했던 것 같다. 소설 중반을 넘어서면서 유미는 엄마의 변화를 조금씩 눈치채며 자신도 희주였음을 털어놓는데, 소설의 첫 부분에서는 유미의 상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썼다. 독자도 눈치채지 못한 어느 순간 유미 역시 희주였던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암 투병이라는 개인적 서사를 바탕으로 소설을 쓴다는 게 힘들 수 있다.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기록을 하지 않고는 항암을 받는 그 가혹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것 같았다. 우리는 대부분 망각하지 않나. 총 8번의 항암을 진행하는 동안 틈틈이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항암이 끝나고 읽어 보았는데, 정말 가관이었다. 슬픔과 분노와 눈물과 한탄뿐인 감정 쓰레기통이었다. 나는 그 노트를 버려야만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소설에 참고할 만한 것은 항암의 진행 과정이나 내 몸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들 뿐이었다.”
-‘위로, 모르는 사람의 위로’라는 말이 소설에 나온다.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건가.
“유미는 모르는 사람의 위로를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유미는 오로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빈 방석을 앞에 두고 마주 앉는다. 유미가 위로를 선택하는 방식은 희주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미는 자신이 가보지 않았던 길을 선택하고, 과감하게 그 방식에 도전한다. 치유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삶의 일부로 품는 것이 아닐까. 유미를 안아 주는 초로의 여인은 자신이 품은 상처가 있었기에 타인을 위로할 수 있었다. 유미 앞에 놓인 빈 방석은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리다. 그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고 싶었다.”
-친구로 등장하는 주선영의 이야기가 겉돈다는 지적도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설의 흐름에 개입시키지 않은 이유는.
“주선영은 길을 걷는 사람이다. 선영이 하루에 25키로미터를 걷는다는 말을 떠올리며 희주는 오백 미터라도 걸으려고 한다. 희주는 선영으로 인해 나약해지는 자신을 매번 되돌아본다. 선영은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희주에게 특별한 영향을 끼친다. 27년만에 희주 앞에 나타난 선영이 굳이 소설의 흐름 속으로 깊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박향의 소설에는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소설이 항상 공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하지만 소설 속의 주인공이 행복하다면, 그는 소설 속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사회에서 외면당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 피해받는 상대적 약자에 시선을 두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어떤 작가는 펜이 술술 나간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박향 작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내 속에 글이 쏟아지듯 펜이 술술 나가는 경험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소설을 쓰는 매 순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다. 심지어 글을 쓰는 와중에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쓰고 있는 부분까지 퇴고하기도 한다. 그렇게 초고를 완성하고 난 뒤에는 사현금 동인들과 합평을 한다. 물론 합평 후에도 다시 퇴고를 몇 번이나 거듭하니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에서 줄곧 작업을 이어 가는 소설가이다. 부산이라는 공간은 작가에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가.
“집 부근에 낙동강이 있다. <희주>에도 나오지만 나는 종종 을숙도로 간다. 을숙도에 서면 바람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인다. 바람이 풀과 나무와 갈대와 강과 먼 산까지 뒤흔든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글을 쓸 어떤 힘이 생기는 것 같다. 산과 강과 바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산은 작가에게 큰 선물 같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부산의 존경하는 선후배 작가들도 빼놓을 수 없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때로는 경쟁하는 모습도 늘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2013년 <에머랄드 궁>이라는 장편 소설로 1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세계문학상 대상을 수상해 문단의 화제가 되었다. 당시 문단 최고 금액의 상금이었는데.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다. 지금도 떠오르는 속상했던 일은 있다. 작가의 노력에 어떤 가치도 두려고 하지 않고, 마치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불로소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불우이웃돕기라는 명목으로 출처를 모르는 많은 전화가 왔다.”
-박향 작가는 올해 밀다원시대문학제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부산소설가협회와 부산 문학관들의 행사기획과 강사로 자주 참여한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선배가 되었다. 등단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부산 문단 확장에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은 작은 마음일 뿐이다.”
-올해 장편 <희주>가 출간되었다. 기획하고 있거나 앞으로 쓰고 싶은 소설에 대해 짤막하게 소개해 달라.
“지금은 단편 소설을 한 편 쓰고 있다. 사람 사이의 아주 미세한 균열이 어떻게 커져서 인간관계를 망치는지 요즈음 관심이 많아졌다. 장편 계획은 아직 없다. 하지만 미래의 인간 소설가가 주인공이 되는 작품을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생각해 보고 메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