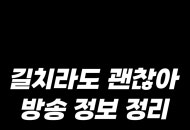재처리 상업화 포기·축소
누수·접촉 없이 저장해야
막대한 비용·재원 필요해
“1980년대엔 재처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1974년 미국 원자력 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문장이다. 사용후핵연료가 재처리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다.
1950년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업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기술에 대한 낙관주의가 팽배하던 때다. 1950~1960년대 원자력업계는 가까운 미래에 재처리 기술이 상업화될 것이라고 봤고, 오히려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1970년대 말부터 회의론이 제기됐다. 지금은 군사적 목적 외 재처리 기술의 상업화는 비현실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 소련, 영국,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도전했지만 상업화 계획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재처리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만들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였다. 재처리 결과물은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도 문제였다. 그나마 프랑스 등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다.
결국 명확한 대책 없이 시작한 일의 결과를 지금 세대가 감당해야 할 때가 왔다. 재처리가 어려우면 남은 방법은 위협이 되지 않게 폐기하는 거다.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핵종 중엔 세슘(30년)처럼 반감기가 짧은 것도 있지만, 플루토늄239(2만 4100년) 등 수만 년 이상인 것도 있다. 최소 몇만 년 이상 누수와 접촉이 없도록 사용후핵연료를 버려야 하는 셈이다.
우주로 보내는 방법도 수시로 거론됐다. 1986년 미국 챌린저호 폭발 사고 뒤엔 이 안은 사라졌다. 사용후핵연료를 모아 우주선에 싣는 것도 어렵고, 발사 과정에 폭발이 일어나 대기권에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퍼지면 되돌릴 수 없는 대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남은 선택지는 지구 안 깊숙한 곳에 묻는 거다. 막대한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는 일이다. 핀란드 ‘온칼로’는 18억 년 된 화강암 지층에 건설됐다. 10만 년 정도는 지각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지대다. 지하 400~450m 지점에 5km 정도 경사형 터널을 뚫어, 100년 동안 사용후핵연료를 차곡차곡 쌓고, 마지막엔 콘크리트 등으로 완전히 봉인할 계획이다.
건설비와 향후 운영비 등은 전체적으로 3조~5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상당한 투자로 어렵게 만든 거대한 설비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의 3분의 1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크기다. 핀란드 원전 발전량은 우리나라 5분의 1수준에 불과해, 우리는 더 큰 시설이 필요하다.
SMR(소형모듈원자로)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 작은 크기로 여러 개 나온다는 차이뿐이다. 에너지 생산 효율성은 보통 설비 크기와 비례하므로, 같은 발전량에선 SMR의 사용후핵연료가 더 많을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