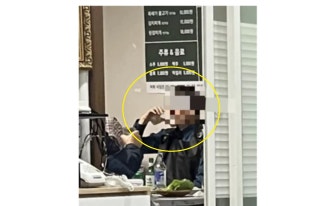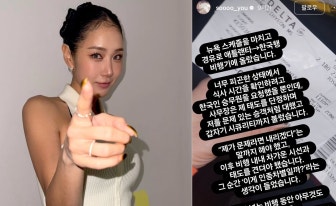임진왜란 발발 첫해인 1592년 8월 14일 경남 거제~통영 해협에서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맞붙었다. 이순신 장군은 47척을 격침하고 12척을 나포하는 등 대승을 거뒀다. 이 한산도 대첩은 일본 수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해 전쟁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진주 대첩, 행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평가받는다.
한산도 대첩은 견내량 대첩이라고도 불린다. 한산도 대첩이 벌어졌던 주요 장소인 견내량(見乃梁)은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와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사이의 좁은 물길을 일컫는 지명이다. 길이는 약 3km, 너비는 지형에 따라 180~400m 정도이다. ‘량’은 좁고 물살이 거센 물길을 일컫는다.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 명량(별칭 울돌목), 경남 하동과 남해 사이 노량, 거제와 칠천도 사이 칠천량 등이 견내량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예로부터 물살 거친 해역은 질 좋은 미역 산지였다. 견내량에는 국내 최고의 돌미역이 서식한다. 수심 10m 깊이 해저 천연 암반에 뿌리를 내리고 거센 조류를 버티며 성장하는 견내량 돌미역은 단단한 식감과 깊은 맛으로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는다. 이 미역에 얽힌 이야기들도 흥미롭다. 이순신 장군 등이 조정에 진상하면서 이 미역은 ‘왕의 미역’이란 애칭을 얻었다. 한산도 대첩에서 패한 일본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가 견내량 주변 무인도로 도주, 13일간 이 미역을 먹으면서 버티다 뗏목을 만들어 겨우 탈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견내량 돌미역 채취 방식은 2020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독특하다. 어민들은 빠른 물살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내린 후 긴 장대로 물밑의 미역을 둘둘 말아 건져 올린다. 하지만 암반 생태계 변화 등에 따라 2009년 전후로 견내량 돌미역 군락이 급감하는 일이 발생했다. 미역 부착을 방해하는 각종 ‘해적 생물’을 암반에서 제거하고 채취를 장기간 중단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미역 숲은 다시 살아났다. 이후 2021년 견내량에 교각을 세워 남부내륙철도를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돼 미역 숲은 또 위기를 맞았지만 어민 등 반발로 해저터널 방식으로 변경됐다. 올해 견내량 돌미역 어민들은 바다 수온 변화 때문에 또 가슴을 졸였다. 더딘 성장 때문에 평년보다 한 달 늦춘 최근부터 채취를 시작했다고 한다. 견내량 돌미역은 그 물살만큼 거친 고난의 역사를 품고 있는 셈이다. 견내량 돌미역이 언제까지나 잘 보전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