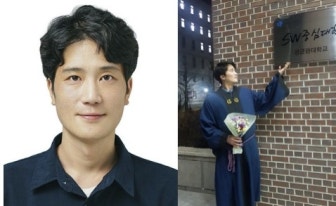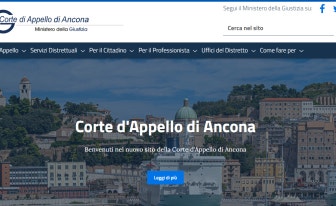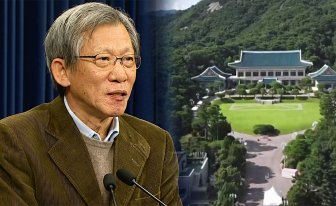오늘도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노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면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집이 깔끔하다. 바닥은 먼지 없이 반짝이고, 싱크대에 설거짓거리도 쌓이지 않았고, 빨랫거리는 세탁 후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다. 누군가 다녀간 걸까? 그렇다. 자동화된 똑똑한 집사, 이른바 가전 '3대 이모님'이 우리 집 가사노동을 맡아주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식사, 빨래, 청소가 3대 가사노동으로 꼽힌다. 식사는 하루 세 번, 빨래와 청소는 적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부터 많게는 매일 필요로 한다. 과거에는 특히 가정주부인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전담했다. 하지만 모두 반복 주기가 짧아 체력과 시간 소모 등 육체적 노동 강도와 정신적 피로도 모두 높은 가사노동이다. 그래서 맞벌이 등으로 바쁜 현대인들의 가사노동 해방을 돕기 위한 가전제품과 플랫폼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스마트홈 시대의 도래
최근에는 단순 가전제품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로봇이 가정에 침투하고 있다. 말벗과 반려동물 노릇을 하는 '반려 로봇', 가사노동을 대신하며 집사 역할을 하는 '집사 로봇' 등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조그마한 인형 모양부터 사람을 닮은 모습까지 다양하게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형태는 달라도 모두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격이다. 조만간 범용성 좋은 휴머노이드가 전격 상용화된다면, 가사 로봇 한 대로 요즘 필수인 '3대 이모님'을 대체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이른바 '스마트홈' 혹은 '웰니스홈' 중심으로 가정이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사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2021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까지 스마트홈을 위한 일명 '이모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두 영역 모두 기술 성숙도와 수요가 높아 가전과 서비스 결합을 통해 '먹고 치우고 빨고 널고 닦는' 고정 스트레스를 덜 수 있다. 이처럼 '이모님'은 보이지 않는 '가족'처럼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가사노동은 주부의 몫이었다. 하루 세 끼 식사, 빨래, 청소는 '여성의 의무'로 불렸고, 가족 공동체는 이 노동 위에서 유지됐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1인 가구의 증가는 이 전제를 흔들었다. 한 사람이 모든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그 공백을 기술과 서비스가 메우기 시작하면서, 가정 안에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구성원'이 들어서게 됐다. 식사 담당은 밀키트, 새벽배송, 식기세척기가 맡는다. 빨래는 세탁·건조기와 세탁대행 서비스가 분담한다. 청소는 로봇청소기와 청소 플랫폼 전문가들이 나눠 가진다. 이 '이모님'들은 스마트홈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생활을 유지한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공동체의 재구성이라 부를 만하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 가족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진 일상이 이제는 기술 및 플랫폼과 결합된 '확장된 공동체' 속에서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1인 가구의 증가도 이 구조를 가속화하고 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전담할 수 없는 노동을 가전과 플랫폼 서비스가 대신한다. 이제 가족은 더 이상 '집안일 분담'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는다. 대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연결된 서비스 네트워크와 가전기기가 보이지 않는 가족 구성원처럼 자리 잡는다.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닌,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자동화 기술이 노동을 흡수하는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모(38)씨는 "육아를 하다 보면 위생상 특히 매일 빨랫거리가 넘쳐난다"면서 "크린토피아, 런드리고 등을 통해 이불 빨래 외에도 관리가 까다로운 옷가지들을 종종 맡기는 편"이라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서모(36)씨는 "로봇청소기를 집에 들이니 어느 정도 바닥 청소는 돼서 편하긴 하지만, 문턱을 잘 못 넘거나 바닥에 짐이 쌓인 곳은 청소가 안 되는 부족함이 있다"며 "구석구석 꼼꼼한 청소를 하려면 결국 사람 손을 타야 하기 때문에 직접 하기도 하고, 필요시 숨고나 청소연구소 등을 통해 전문가를 부르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삼정KPMG가 올해 4월 발간한 '세탁 시장의 뉴패러다임 주도하는 세탁 서비스 플랫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세탁 시장 규모는 2026년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약 5조1000억원에서 2023년 5조7000억원으로 성장했다.
가사노동도 자동화·분담·위탁 시대로
궁극적으로 이러한 가사노동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노르웨이의 1X 테크놀로지스는 최근 'NEO'라는 이름의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다. 이 로봇은 사람처럼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집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거나 음식을 운반하는 시연을 선보였다. 일본의 도요타, 미국의 피겨(Figure), 중국의 유니트리(Unitree) 역시 가사 업무를 목표로 한 인간형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다.
구글과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개발한 '타이디봇(TidyBot)'은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해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카메라와 딥러닝을 이용해 쓰레기와 물건을 구별한다. 테슬라의 '옵티머스(Optimus)'는 손가락의 미세한 조작으로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잡고, 집을 정리하는 시연을 선보였다. 이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청소나 정리에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전문가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가정에서 인간의 집안일을 완전히 대신하려면 최소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본다. 이유는 명확하다. 집이라는 공간은 예측 불가능하고 훨씬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로봇은 조명, 그림자, 반사광, 다양한 형태의 물체를 모두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그릇과 쓰레기를 구분하거나, 떨어진 물건을 적절한 위치에 놓는 것은 단순한 연산 이상의 '상황 판단' 능력을 요구한다. 유리컵과 플라스틱 통을 동일한 힘으로 쥐었다간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놓친다. 현재의 로봇 손은 공장용으로는 정밀하지만, 가정용의 섬세한 동작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미끄러운 바닥, 복잡한 가구, 문턱과 계단 등은 로봇에게 장애물이다. 여기에 에너지 문제도 있다. 24시간 작동하려면 고성능 배터리와 효율적 충전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무게와 용량의 한계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청소, 세탁, 요리 보조, 물건 정리 같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은 로봇이 맡기 좋은 영역이란 점에서 낙관적인 전망이 대세인 것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