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넷, 자리는 하나.”
구직자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고민이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25년간 다닌 제지회사에 다니던 중년의 남성 만수(이병헌 분)에게도 어느 날 이 묵직하고도 힘겨운 숙제가 주어진다. 회사에서 준 장어를 가족들과 나눠 먹고 “다 이루었다”며 기뻐한 다음 날 그는 해고된다. 만수는 곧바로 구직 경쟁에 뛰어들지만 1년이 지나도록 비좁은 취업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자 그는 경쟁자들을 차례로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가족을 위한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렇게 그의 총구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구직자들을 향한다.
지난 9월 24일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줄거리다. 물론 만수가 벌이는 행위 자체는 극단적이고 잔인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기존의 일자리마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요즘, 누군가는 만수와 비슷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관객들의 평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지만 작품이 가진 의미와 영향력이 남다른 이유이다.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국내외 관심은 높은 편이다. 국내 관객은 10월 14일 기준 266만 명을 기록했다. 박 감독의 전작 ‘헤어질 결심’(190만 명)에 비해 많은 숫자이며 손익분기점(130만 명)도 돌파했다. 해외 반응도 좋은 편이다. 개봉 전부터 200여 개국에 선판매됐으며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국제관객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박찬욱 감독 특유의 유려하면서도 단단한 자신감이 돋보이는 서사의 추진력, 가족의 붕괴, 가장의 위기, 그리고 국가의 현주소를 그려낸 초상”이라고 호평했다. 미국의 영화 매체 인디와이어는 “박찬욱 감독의 탁월하고, 잔혹하고, 씁쓸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자본주의 풍자극”이라고 소개했다.
‘어쩔 수가 없다’를 보는 내내 관객은 ‘어쩔 수가 없는가?’라고 자문하게 된다. 만수의 행위에 대한 질문일 수 있지만 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작고 큰 부조리와 폭력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먹고살아야 하니까, 가족들을 위한 거니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 같은 갖은 이유로 우리는 타인을 공격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가? 그렇게 영화는 이 세상과 시대를 둘러싼 ‘어쩔 수 없어 보이는’ 현상들을 비춘다.
만수는 중산층에 속한다. 2층짜리 주택에서 아내, 두 자녀, 두 마리의 개와 함께 여유롭게 지낸다. 1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에 시달리진 않는다. 취업에 계속 실패해도 만수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포기할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집을 팔려고 하지도 않고 제지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취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라 여기는 ‘펄프맨’으로서만 일하고 싶어한다. 그리하여 그 길에 걸림돌이 될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정보를 기이한 방식으로 취득한 후 살인을 차례로 저지른다. 스스로 그럴싸한 명분을 만든 다음 타인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만수는 자신을 자른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를 겨냥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평소 얼굴도 잘 모르고 자신과는 다른 회사에 다니다 해고된 사람들에 해당한다.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시스템에 대해선 체념하듯 수용하면서도 그 시스템에 의해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희생양이 된 사람들을 공격하는 셈이다. 노동자들끼리 서로를 잠재적 적으로 여기고 분노와 희생의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이 곧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다’며 체념하고, 이를 핑계로 또 ‘어쩔 수가 없다’며 부조리와 오류를 만들어 땅 아래에 깊숙이 묻어온 인간의 역사 자체가 아닐까. 만수처럼 그 땅 위에 나무를 심고 또 심어 왔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영화는 이를 관통하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진다.
또한 ‘어쩔 수가 없다’는 기술의 발전 등 외부 요인의 변화로 언제든 일자리를 쉽게 잃을 수 있다는 현대인의 불안을 담고 있다. 구직-해고-구직의 사이클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자는 몇 명이나 될까, 과연 내가 그 생존자가 될 수 있을까? AI 기술로 돌아가는 공장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는 만수의 모습은 그 불안을 극대화한다. 이처럼 하나의 콘텐츠가 현대인의 보편적인 두려움을 다층적으로 다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작품을 통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묻어온 산업계의 냉혹한 현실도 되돌아보게 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 특히 영화계엔 길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플랫폼의 발전으로 극장은 텅 비어 가고 있다. 당장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 순간부터 이를 느낄 수 있다. 평일에도 북적이던 극장은 추석 연휴가 되어도 한산했다. 극장 곳곳에 있던 직원들도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영화를 보러 간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로 예매를 하고 팝콘을 주문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어쩔 수가 없다’고 체념만 해온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이 아닐까.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한국 영화 시장에 시급히 호흡기를 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전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비도 시급하다. 글로벌 OTT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제작비 상승으로 국내 산업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AI에 콘텐츠 관련 일자리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2023년 1만1500여 명에 달하는 미국 할리우드 작가들이 대규모 파업을 했던 이유도 AI 때문이었다. AI에 작가들의 창작물을 학습시키는가 하면, AI가 만든 대본 초안을 작가들에게 수정하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리 창작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과 편집의 영역까지도 AI가 침범하고 있다. 이미 한두 줄의 프롬프트만 넣으면 AI가 완성도 높은 영상을 뚝딱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왔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AI의 공습이 더욱 강화된다면 수많은 창작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누구나, 언제든 만수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야.” 만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작품에서 비록 만수의 비장한 심정이 극단적 행위로 이어지긴 했지만 그 불안과 공포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콘텐츠 업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우리는 ‘K콘텐츠 열풍’이라는 과실이 주렁주렁 달린 큰 나무를 보고 환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나무 아래의 땅 깊은 곳까지 바라봐야 한다. 뿌리가 흔들리거나 조금씩 썩고 있다면 얼른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은 넷, 자리는 하나”가 아니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모여 다양한 자리에서 좋은 콘텐츠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
김희경 인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kimhk@inje.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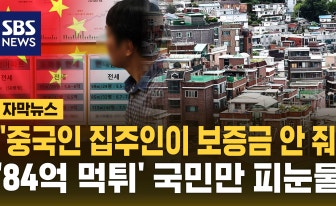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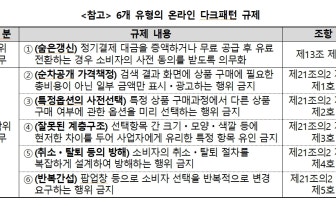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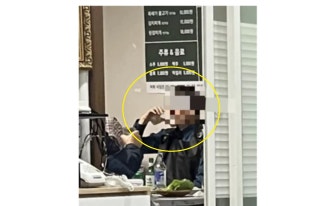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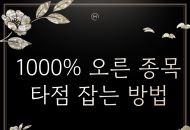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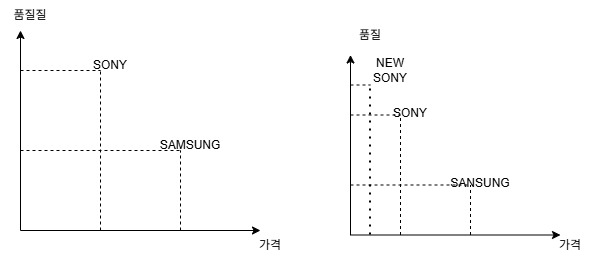.jp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