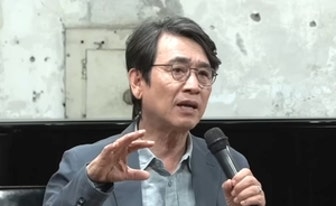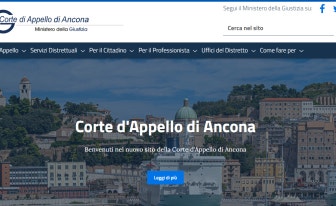산으로 둘러친 여자만 갯벌을 품은 벌교에 들어서자 가을 날씨답게 여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태백산맥 문학의 거리에 접어들자 운전하는 버스 기사님이 살짝 길을 놓친 모양이다.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늦게 문학의 거리에 도착한다. 일행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여행은 항상 변수가 생긴다. 어쩌면 그것 또한 여행의 맛 아닐까.
벌교는 일제강점기 낙안군이 폐지된 바람에 보성군에 편입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벌교가 순천만과 여자만 갯벌을 끼고 순천과 고흥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란 사실을 점치고, 벌교를 수탈을 위한 전진 기지로 구축한다. 소설 <태백산맥>에 나온 '중도 방죽'도 마찬가지. 중도 방죽은 일본인 나카시마(중도)가 수탈을 위해 갯벌을 막아 쌓은 방죽이다. 소설 <태백산맥>에 따르면 일본이 패망하자 중도 방죽을 이어받은 현 부자네는 집 입구 누각에 올라 중도 방죽을 내려다보며 소작인들을 감시한다.
소설 <택백산맥>의 흔적을 따라서
| ▲ 소설 태백산맥 문학기행길 |
| ⓒ 김병모 |
순천 낙안 벌 끝자락, 소박하기만 했던 갯벌마을에서 수탈의 아픈 역사를 안았던 벌교가 소설 <태백산맥> 산실이 될 줄이야. 어찌하라, 벌교는 다시 1948년 여순 사건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데. 필자는 벌교 문학의 거리를 걸으며 소설 <태백산맥> 흔적을 반추한다.
일제강점기에 땅으로 바다로 길을 내 탐욕을 채우려는 일제의 벌교 수탈은 계속된다. 해방 직후 여순 사건의 참극이 벌교로 이어진 소설 <태백산맥>. 좌우 이념대립으로 휘말린 벌교의 이야기이다.
소설 <태백산맥> 문학기행 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술도가 집이다. 소설 <태백산맥>을 처음 연 현 부자네 집 별채 신(神) 방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무당의 딸 소화와 사랑을 나눈 정하섭 본가이기도 하다. 일행은 호기심이 가득한 채 술도가에 들어갔지만, 흐트러진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어 안타까웠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보성여관을 둘러본다. 이 여관은 일제강점기 때 한식과 일본식 다다미방이 혼합된 근대건축물이다. 소설 <태백산맥>에서는'남도여관'으로 개칭되어 빨치산 토벌대가 투숙하면서 지휘 본부 역할을 한다. 보성여관은 굴곡진 역사의 한복판에서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마주해야 했다. 지금도 보성여관 1층은 벌교와 여관의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실과 카페가 자리하고, 온돌방을 갖춘 숙소로 복원하여 손님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재미있게도 조정래 작가의 집필실도 재현해 놓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다. 점심 먹을 때가 되었나 허기가 진다. 일행은 식당으로 가기 위해 벌교 천 소화(昭和)다리를 건넌다. 소화다리는 1931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다리로 '부용교'란 이름이 있었다. 이 다리는 여순사건부터 6.25 대격랑이 요동치면서 발생한 우리 민족의 비극과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맞이한다. 좌우 양측에서 밀고 밀릴 때마다 숱한 양민들을 처형했던 비극의 다리. 소설 <태백산맥>에 따르면 소화 다리 밑으로 시체가 널린 비극의 다리이다.
일행들은 허기진 배를 붙잡고 꼬막 무침으로 유명하다는 한 식당으로 서두른다. 맛집답게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다. 의자에 앉자 마다 꼬막무침을 필두로 참꼬막 요리가 나오는데 음식마다 입맛을 자극한다. 평소 가정에서 먹는 꼬막은 그물로 잡은 새꼬막일 수 있단다. 반면 참꼬막은 벌교 여자만 청정 갯벌에서 잡은 것으로 유독 맛을 더해준다고 한다. 망둥이찜 역시 부드럽고 비린 기색이 없다. 된장국마저 맛깔스럽고 구수하다. 남도 음식 맛이야 다 아는 처지지만, 꼬막무침 비빔밥 맛은 일품이다.
배를 채울 만큼 채우고 나와 꼬막 거리를 둘러보니 건너편 식당 문에 소설 <태백산맥>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가 왔다 갔다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다. 벌교에 다시 올 때, 그 식당을 가볼 요량이다.
벌교는 이제 아픈 질곡의 역사를 넘어 감성과 문학의 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거리마다 식당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 중도 방죽은 좌우 갈등을 넘어 귓불에 스치는 갈대 바람 휘날리는 남도 감성의 길이 되었다. 가고 싶은 벌교 남파랑 길로 거듭나고 있다. 소화 다리를 건너 꼬막 맛집도 즐비하다.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라는 조정래 작가의 말을 새기면서 소설 <태백산맥> 문학기행 길을 걸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