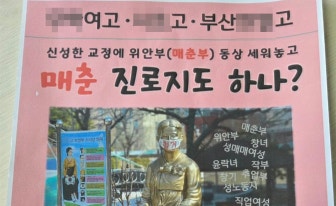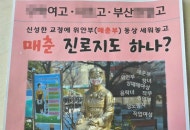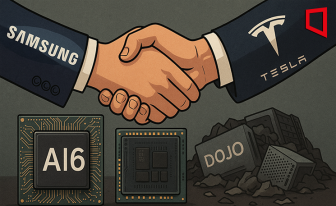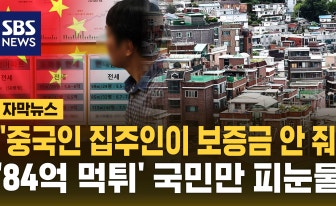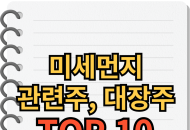섭식장애 통계의 함정, 청구서 집계에 불과한 현실
한국에는 아직 섭식장애에 대한 실질적인 유병률 조사나 역학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공식 통계'는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진료비 청구 데이터뿐이다. 이 데이터는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력한 진단 코드(F50)와 진료 행위 코드의 집합으로, 환자의 실제 규모나 치료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다.
의사가 한 번이라도 '섭식장애' 코드를 입력하면, 그 사람은 그 해의 '환자 수'로 계산된다. 다시 내원하지 않아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혹은 단순 상담만으로 끝나도 모두 같은 '환자'로 집계된다. 어느 진료과의 의사든 이 코드를 쓸 수 있고, 진단의 정확성이나 치료의 연속성도 구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이런 통계를 인용해 "20대 여성 환자가 급증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래도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환자가 제때 병원을 찾지 않은 탓이라는 도덕적 책임 전가가 일어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섭식장애는 접근 가능한 전문 의료 인프라가 거의 없고, 치료 체계도 부실하다.
국제 연구들에 따르면 섭식장애를 겪는 사람 중 실제로 전문 치료를 받는 비율은 3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처럼 전문 진료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이 통계는 때로는 의료 시스템의 실패를 오히려 가린다. 예를 들어 14세 때부터 거식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한 소녀의 사례를 보자. 강제입원과 부적절한 처치가 거듭됐고 상태는 결국 악화됐다.
그러나 심평원 통계상 이 아이는 매년 '10대 여성 F50 환자 1명'으로만 기록된다. 다섯 해 동안의 의료 실패는 단 한 줄의 숫자로 압축되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지금 한국에서 "섭식장애 통계"라 불리는 것은 진짜 통계가 아니라 청구서의 집계에 불과하다. 그것은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섭식장애를 의료산업의 구조 속에서 소비되는 수치로 전락시킨다.
정말 필요한 것은 심평원 데이터의 반복 인용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유병률 조사와 역학 연구다. 섭식장애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정책도, 지원도, 치료도 존재할 수 없다. 통계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통계라고 부르기 어려운 데이터를 현실의 전부로 취급하는 정치와 행정의 태도가 문제다.
섭식장애 같은 사회문화적 질환이 드러내는 것은 개별 환자의 약함이 아니라, 그 사회가 고통을 어떻게 무시하고, 오독하고, 이용하는가의 방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의 재해석이 아니라, 그 숫자 너머의 현실을 볼 눈이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오마이뉴스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아웃링크)로 이동합니다.
-
QR을 촬영해보세요. 대통령 이재명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
QR을 촬영해보세요.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3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더보기
오마이뉴스 랭킹 뉴스
오후 4시~5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이슈 NOW
언론사에서 직접 선별한 이슈입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