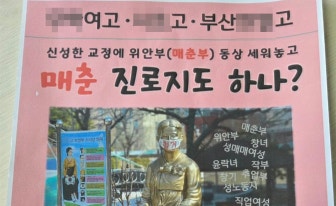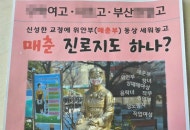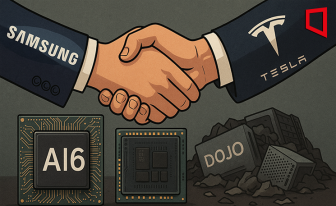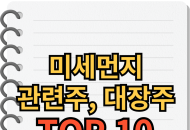| ▲ 미국의 공립학교 아주 넓은 학교 입구 모습 |
| ⓒ 전정일 |
미국의 학교를 탐방하며 만난 교사와 학부모들을 통해 미국 교육의 현실을 들을 수 있었다. 동부와 서부의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지만 일부의 이야기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지역 격차, 교사 소진, 총기 위협과 학생 안전 문제는 미국 어느 도시에서든 큰 화두였다.
주소가 아이의 미래를 가른다
뉴욕 맨해튼의 한 공립학교는 첨단 과학실험실과 예술 교실에서 학생들은 풍요로운 자원을 누리고 있다. 반면 올바니 외곽 학교의 교실은 낡은 교재와 부족한 컴퓨터로 가득했다. 한 학부모는 "주소 하나 때문에 아이의 미래가 갈린다"며 씁쓸해했다.
한국도 서울 강남권과 농어촌 학교 간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충남의 대안교육기관 금산간디학교는 전혀 다른 교육 풍경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농사·공동체 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고, 교과서보다 삶 속 경험을 중시한다. '삶과 배움의 통합'을 통해 지역 격차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시애틀 북부의 한 초등학교. 수학 교사가 부족해 학기 내내 대체 교사가 수업을 맡았다. 한 학부모는 "학생보다 시험 성적 보고서를 더 많이 챙긴다" 며 탈진한 표정을 짓는 교사가 많다고 했다. 낮은 임금과 과중한 행정은 교사의 사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광주의 대안교육기관 지혜학교는 다른 선택지를 제시한다. 이곳에서는 시험 대신 프로젝트와 공동체 활동이 중심이다. 교사들은 '성적 보고서'가 아닌 '학생의 성장 기록' 을 쓰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의 과정을 중시한다. 이는 교사 피로를 줄이고 학생 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총기 공포와 민원
워싱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총기 사건 대비 훈련이 일상화돼 있었다. "실제 사건이 나면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학생과 학부모의 말에는 두려움이 묻어났다. 또 샌프란시스코 학교 교실에서는 성소수자 교육, 인종차별 역사 수업을 두고 학부모 간 갈등이 격해졌다고 한다. 교사들은 수업보다 민원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다.
한국은 총기 위협은 없지만 지나친 학부모 민원,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두고 교실을 흔든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 과천의 대안교육기관 맑은샘학교는 마을과 함께 민주적 학교 운영을 실천하며 다른 길을 보여준다. 학생회와 교사·학부모가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놀이·생태·문화 활동을 중심에 두며 "학교가 곧 마을"이라는 철학을 구현해 왔다.
| ▲ 산 속 몸놀이 학교 둘레 산에서 몸놀이 하는 학교 모습 |
| ⓒ 전정일 |
미국 공립학교의 위기는 재정 불평등, 교사 소진, 정치 갈등, 학생 안전 문제로 요약된다. 한국은 총기 위협은 없지만, 입시 경쟁과 지역 격차, 교사 피로 누적이라는 문제에서 미국과 닮았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금산간디학교, 광주지혜학교, 맑은샘학교 같은 대안교육 모델은 이미 존재하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 교육의 미래는 현존하는 대안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공교육 속에서도 학습자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생태계를 키우는데 달려있다."
뉴욕의 학부모, 올버니와 시애틀의 교사, 워싱턴주,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의 학생이 드러낸 불안과 피로는 한국에도 경고음을 울린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대안학교들은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교육공동체와 행복한 교육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웃는 교실이 가능하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다. 사람이 많이 살고 땅덩이가 큰 나라 미국은 다양한 학교가 있는 만큼 공교육에 드러난 문제도 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공교육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질만한 사건들과 화두가 있었다.
입시와 경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교육만큼 불안과 피로가 가득했다. 어디에서든 희망을 만들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교육 현장은 존재한다. 미국과 한국의 미래교육 현장이 들려주는 교육의 공공성에 주목할 때다.
덧붙이는 글 | 미국은 주마다 특색 있는 학교가 많고,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아주 많다. 공립학교도 주마다 중요한 화두가 다를 수 있다. 예체능 활동을 장려하기에 미국의 학부모들은 상당한 교육비를 지출한다. 한국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학원같은 곳은 미국에도 발달해있었다. 그만한 비용과 학부모 뒷받침이 필요했다. 교사들이 처한 어려움도 많았다.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는 문제는 미국과 한국 모두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