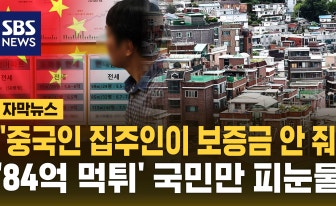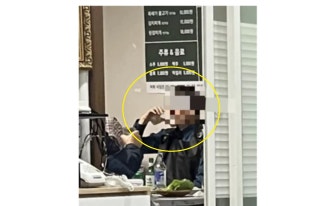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남소연 |
[검증 대상] '경영 판단의 원칙' 처벌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도 않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 의사를 밝히며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숙원이었던 '배임죄 폐지' 추진을 공언하고,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TF까지 꾸리며 '중도 보수'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등으로 재계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자, 정권 차원에서 일종의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이다.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 근거 중 하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처벌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오마이뉴스>가 검증해 보았다.
[검증 내용①] 미국과 영국, 민사·형사 책임 묻지 않는다
'경영 판단의 원칙', 이른바 'BJR'은 'Business Judgment Rule'의 줄임말로 영미법의 대표적인 원칙이다. 이사의 '합리적 절차'와 '선의'에 기초한 경영 판단은, 설사 사후 손실이 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민사 기준의 면책 원리에 해당한다.
실제로 미국 연방법과 영국 형법은 한국처럼 포괄적으로 '배임죄'라는 별도의 죄목을 법률에 두지 않는다. BJR 원칙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투자가 실패했다든가, 합병 결정이 회사의 손해로 이어졌더라도 '단순 경영 판단'만으로는 형사·민사 모두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리적 절차를 거친 경영상 판단이었다면 법원이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 원칙을 확립한 주요 판례들이 여럿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Aronson v. Lewis' 사건을 들 수 있다. 1984년 당시 법원은 "이사의 경영 판단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며 "이사의 결정이 선의(good faith), 적절한 주의(due care), 합리적 믿음(reasonable belief)에 기초했다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2006년, 같은 법원의 'In re Walt Disney Co. Derivative Litigation' 판결도 비슷하다. 월트 디즈니는 1990년대 중반 마이클 오비츠를 사장으로 영입했는데, 14개월 만에 퇴직하게 되면서 퇴직금 약 1억 4000만 달러가 지급됐다.
이에 주주들이 이사회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당시 이사회가 "이상적(best practices)"이지는 않았다고 비판했지만, 최종적으로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과 "불성실(bad faith)"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다.
'배임죄'를 별도의 죄목으로 다루는 국가들 역시도 '경영 판단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영 판단 자체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에 가깝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라 볼 수 있다.
[검증 내용②] 한국도 단순 경영 판단은 처벌하지 않는다
| ▲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7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 ⓒ 연합뉴스 |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세계적 흐름'에서 동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1953년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5조 등)가 도입된 이후, 군사독재 시절 악용된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배임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형법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임무 위배 행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충실 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한다. 단순 경영상 실패는 임무 위배로 보지 않는다.
이어 회사나 주주의 '재산상의 손해'가 증명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만 한다. 특히, 경영진이 손해 발생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특정 행위를 했다는 '고의성' 입증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행위들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 취득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리하면, 현행 한국 형사법 체계에서 '① 임무위배 + ② 손해 발생 + ③ 고의성 + ④ 이익 취득 목적'이 모두 인정돼야만 '경영 판단'이 처벌받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와 연관돼 있다.
지난 7월 17일,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법리를 오인하지 않았다며 이재용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배임죄' 혐의도 포함 있었는데, 검찰은 고의성 등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법원은 회계처리 등 기업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며, 단순 경영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즉, 단순 경영상 실패, 예컨대 과실에 의한 투자 실패 같은 행위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한국에서만 과도하게 기업인들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경영 행위를 처벌한다는 주장은 재계의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
[검증 내용③] 배임죄 유지 국가 다수, 영미권도 '배임 행위'는 처벌 가능
민주당은 상기한 논리를 확장해 배임죄 폐지에 힘을 싣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배임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다. 배임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라고 볼 근거도 희박하다. 오히려 여러 국가들은 여전히 '형법상 배임죄'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독일·일본 등 '대륙법' 국가들이 그렇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대륙법을 바탕으로 법 체계를 정비했고, 일본의 형법 체계가 이후 한국 법 체계의 근간이 된 역사를 생각하면 한국의 '배임죄' 역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명확해진다.
독일은 형법 제266조(Strafgesetzbuch, StGB §266 Untreue)를 통해 배임죄를 처벌하고 있다.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본인(위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혹은 "법률·계약·신임관계에 따른 재산관리 의무를 위반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 한국의 업무상 배임과 유사한 구조이다.
프랑스는 형법 제314-1조(Code pénal, Article 314-1 – abus de confiance)를 통해 '신뢰남용'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는 "타인의 재산이나 자금을 보관·위임받은 자가, 그 사용 목적에 반해 재산을 유용하거나 본인을 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용어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배임과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일본은 형법 제247조(第247条 業務上背任罪)에서 '업무상 배임'을 규정하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을 해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한다. 한국의 업무상 배임과 거의 동일한 규정으로, 회사 경영진 관련 형사소송에 자주 적용되는 조문이다.
심지어, 미국과 영국 역시 의도적인 배임 행위에까지 면책을 주지는 않는다. 미국은 고의적인 기망이나 횡령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사기(Fraud)·횡령(Embezzlement)·신탁의무 위반(Breach of fiduciary duty)을 적용해 민·형사상 처벌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주법 같은 경우에는 '수탁재산의 오용' 같은 유사 조항이 존재한다(예: 텍사스 형법 §32.45 '수탁재산의 오용').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위 남용 사기(Fraud Act 2006) 제4조가 사실상 우리나라 배임죄 조항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지위를 부정하게 남용해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취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처럼 '단순 경영 판단 자체'는 존중하지만,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 이득을 추구한다면 처벌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다.
[결론] 사실 반 거짓 반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며, 배임죄 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검증한 결과,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 단순 경영 판단에 의한 투자 실패 등은 세계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역시 '경영 판단'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며, 명확한 원칙에 입각해 각 요건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는 '대륙법' 국가는 물론이고, 배임죄 명목을 따로 두지 않는 '영미법'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한국만 특별히 '경영 판단의 원칙'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 과장에 가깝다.
배임죄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오마이뉴스>에 "경영 판단의 처벌은 당연히 고의성을 전제로 한다"라며 "이를 근거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리는 말장난에 가깝다. 단순 경영 판단은 애초에 배임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측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수가 배임죄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입법례도 많이 있다"라며 "특히나 소액 주주나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고의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소송을 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배임죄"라고 강조했다.
배임죄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고, 실제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자주 있어 왔다. 그러나 배임죄에 대한 비판적 연구(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 존중, 고려법학 2015 no.78)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판례에서 경영판단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 (법원이) 경영 판단을 함에 있어 경영합리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사실 반, 거짓 반'으로 판정한다.
| [오마이팩트] |
| 김병기 |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 "경영 판단의 원칙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도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