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현실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한다. 가상현실은 사용자가 고글 등 외부 장치를 착용하고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보면서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듯한 생동감과 몰입감을 느끼게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한계는 뚜렷하다. 눈을 감거나 외부 장치를 벗으면 곧바로 현실로 돌아온다.
이와 달리 뇌내현실은 뇌가 감각하고 지각하는 방식을 직접 조작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봤다고 느끼게 만들고 만지지 않은 사물을 만졌다고 착각하게 할 수 있다. 현실과는 분리된 가상 세계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인간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자체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뇌내현실은 가상현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공동연구팀 ‘브레인게이트2’는 뇌에 아스피린 알약 크기의 칩 2개를 이식한 사지마비 환자가 알파벳 기준 분당 90자까지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해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현재 KAIST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는 의수를 착용한 환자의 촉각과 후각을 뇌 신호로 직접 자극해 ‘사물을 만지는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열어줄 세상은 무궁무진하다. 의료 분야에서는 신경마비 환자가 다시 걷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 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는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뇌내현실을 통해 안전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감각과 정서를 완전히 몰입하도록 돕는 차세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관심이 사그라진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을 뛰어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일상에서는 언어라는 수단을 거치지 않고 뇌 신호만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뇌내현실은 무한한 가능성만큼이나 위험성도 크다. 2020년 아마존 프라임에 공개된 드라마 ‘업로드’는 뇌내현실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인간이 죽음을 맞으면 인간의 의식은 클라우드에 ‘업로드’되고, 뇌에 연결된 신호를 이용해 생전 감각과 기억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진 세계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설정이다. 일종의 뇌내현실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사람들은 육체를 잃었음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경제 활동을 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뇌 신호로 만들어진 사후세계에서도 철저한 자본주의 체계가 작동한다. 기업의 서버와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하는 것이다. 비싼 구독료를 내는 사람은 더 풍성한 음식과 5성급 호텔을 제공받는다. 반면 구독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아무런 경험도 하지 못한 채 일상이 멈춰버린다.
뇌 데이터 해킹·유출이라는 또 다른 우려도 있다. 뇌 신호를 직접 조작하는 뇌내현실 기술은 인간의 생각 자체를 해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운다. 뇌 데이터는 인간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정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실보다 매력적인 뇌내현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사회적 단절과 중독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이 기술을 독점할 경우 감각과 의식, 기억까지 통제하는 디지털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화 ‘매트릭스’와 드라마 ‘업로드’가 보여준 충격적인 미래는 더는 가상의 이야기로만 남아 있지 않는다. 뇌내현실 기술은 인간적 경험의 마지막 경계인 뇌와 현실 사이 벽을 허물고 있다. 기술이 주는 혜택과 가치는 분명 거대하다. 하지만 인류가 감당해야 할 위험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 뇌내현실 기술이 인간을 가짜 세상에 가둘지, 아니면 새로운 자유와 혁신을 만들어낼지는 우리의 선택과 합의에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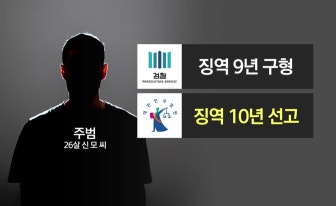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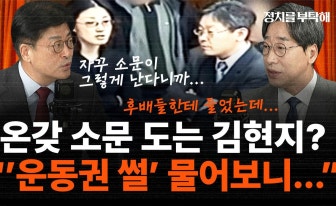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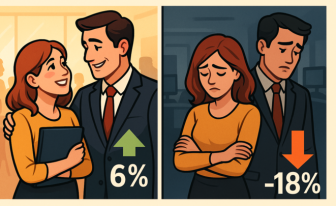















.jp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