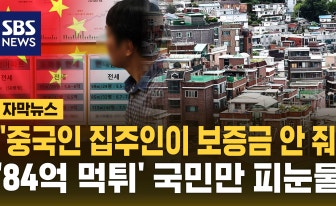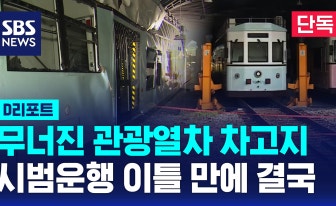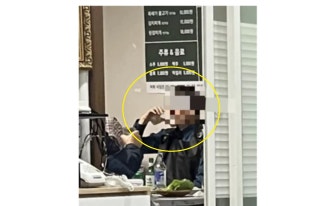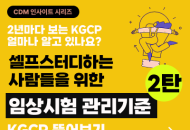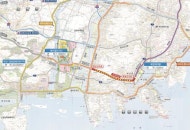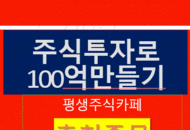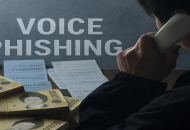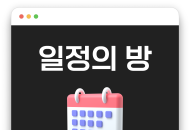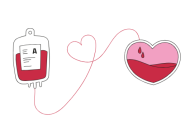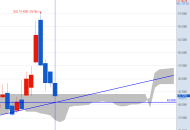사람들은 잘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잘살면 만족할까. 아니다. 진짜 원하는 건 그냥 잘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잘사는 것이다. 따라서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그냥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남들보다 돈이 많은 것이다. 절대적 수준은 상관없다. 누군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 사람들의 본심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다.
“현재 내 연 수입은 5만 달러(약 7000만 원), 다른 사람은 2만5000달러(약 3500만 원)다. 원한다면 내 연 수입을 10만 달러로, 다른 사람은 20만 달러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겠는가.”
연 수입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나면 당연히 좋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다른 사람의 2배를 벌던 내가 그들의 절반 수준밖에 못 번다. 절대적으로는 수입이 많아지지만 상대적으로는 더 적어진다.
응답자의 56%, 즉 과반 이상은 “지금 이대로 있겠다”고 답했다. 연 수입이 2배로 증가하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건 내 연봉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으냐 적으냐였던 것이다. 10만 달러를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버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질문을 바꿔서 묻기도 했다. “지금 내 연 수입은 10만 달러, 다른 사람은 20만 달러다. 원하면 나는 5만 달러, 다른 사람은 2만5000달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겠는가.” 이때 내 연 수입은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반토막 난다. 다만 반밖에 못 벌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아무리 상대적 수입이 중요하다고 해도 연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자기가 못살게 되면서까지 자존심을 지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응답자의 38%가 “연 수입을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줄이겠다”고 답했다. 과반은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내가 망하더라도 다른 이를 더 망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38%나 된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이 50%를 넘으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자본주의뿐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붕괴된다. 어떤 제도도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38%나 된다니, 이 사회는 항상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이다.
에르조 루트머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도 2004년 미국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전국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이런 질투심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평균 15만 명의 연도별 소득, 행복도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다른 사람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내 행복도는 감소했다. 내 소득에는 변화가 없는데, 다른 사람 소득이 증가하면 내 행복도가 감소했고 그 감소폭이 굉장히 큰 편이었다.
경제력과 관련해 가장 행복도가 낮아지는 사건은 실업이다. 이 조사에서 실업의 행복도 계수는 -0.428이었다. 일자리를 잃는 경험을 할 때 행복도가 0.428 낮아진다는 뜻이다. 내 집 없이 집을 임차해 살 때 행복도 계수는 -0.182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 소득이 증가할 때 행복도 계수는 -0.208이었다. 질투로 인한 행복도 저하가 실업보다 낮지만 임차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높았다. 즉 내 집 없이는 살지언정 다른 사람 소득이 늘어나는 꼴은 못 본다는 얘기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가 좋다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평등을 추구하는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평등해야 한다는 정의감과 공정성 때문에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평등을 강조한다. 이때 평등은 차별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이니 정당하고 긍정적인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평등을 주장하는 또 다른 동기도 존재한다. 앞서 본 연구 결과들처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사는 게 싫어서 평등을 주장하는 경우다. 못사는 사람들을 잘살게 하려고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나보다 잘살지 못하게 하려고 혹은 나보다 잘사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성적을 떨어뜨리려 평등을 주장한다. 이런 목적으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을 악의적 평등주의라고 한다. 질투, 시기심을 바탕으로 한 평등주의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좀 더 잘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자기가 잘사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잘사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모두가 잘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두가 남보다 잘사는 건 불가능하다. 과반 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경제 상황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잘살게 되더라도 구성원들의 불만은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니 주관적인 것은 개인에게 맡기고 사회는 객관적인 것, 절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모두가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살기를 원한다. 자신이 손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망하기를 바란다. 이런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사회는 필연적으로 공정한 평등주의가 아니라, 악의적 평등주의가 된다. 이게 인간 본성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피해야 할 길이다. 모두가 원해도 그런 길은 피해 가야 한다.
최성락 박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양미래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1년 투자로 50억 원 자산을 만든 뒤 퇴직해 파이어족으로 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