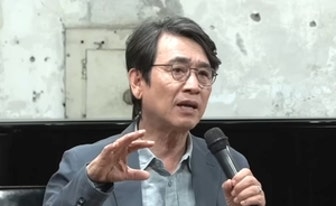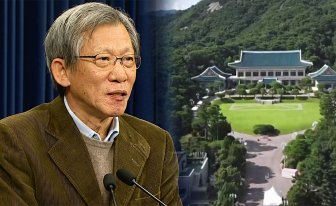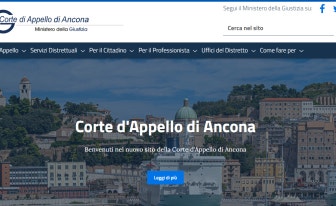그런데 이 거리 변화를 수십 년간 정밀하게 관측한 결과에 따르면 달은 매년 평균 3.8㎝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남긴 레이저 반사경과 아폴로 14·15호가 추가한 반사경을 통해 50년 넘게 관측한 결과다. 지구와 달의 거리는 ㎝ 단위로 측정되며, 오차는 ㎜ 수준에 불과하다.
달이 멀어지는 이유는 조석력 때문이다. 조석력은 천체 사이 중력차로 발생하는 힘을 뜻한다. 바다는 달의 인력에 이끌려 부풀어 오르는데, 자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바닷물 융기는 달보다 약간 앞선 위치에 생긴다. 이 앞선 융기가 달을 잡아끌면서 지구의 회전 에너지를 달로 넘겨주고, 그 결과 달은 점점 더 먼 궤도로 밀려나게 된다. 반대로 지구의 자전 속도는 줄어든다. 이러한 조석력에는 지구의 자전, 해양과 대륙의 재편까지 얽혀 있다. 이는 행성이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고 흩으며 균형을 유지해왔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다. 지금의 후퇴 속도를 거슬러 계산하면 이미 약 15억 년 전 지구와 달의 궤도가 겹쳤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달 형성 시기는 약 45억 년 전이다. 이 불일치는 달이 항상 같은 속도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궤도 변화 속도가 달랐음을 의미한다.
먼저 달 내부의 특수한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 위성 탐사와 중력장 관측에 따르면 달 맨틀 깊숙이에는 점성이 낮은 흐물흐물한 층이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구에서 전달된 조석 력이 이곳에서 흡수되거나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달의 후퇴 속도가 늦춰졌을 수 있다.
반대로 최근 연구에서는 달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밀려난 정황도 포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산타크루스(UC 산타크루즈), 독일 막스플랑크 태양계연구소,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연구진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달이 태어난 직후인 약 43억5000만 년 전 내부가 다시 녹아내리는 ‘재융해(remelting)’가 일어났을 개연성을 제시했다. 당시 지구는 마그마 바다로 뒤덮여 있어 이 시기 조석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달이 궤도의 특정 구간을 지날 때 지구의 회전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전달돼 내부가 뜨겁게 달궈졌고, 이런 격렬한 에너지 교환이 달을 빠른 속도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론은 ‘공명 로킹(resonance locking)’ 모델이다. 이는 지구의 해양 진동 주기와 달의 궤도 운동이 특정 순간에 맞아떨어질 때 조석력이 갑자기 강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달이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멀어질 수 있다. 지구–달 시스템이 마치 공명하는 악기처럼 작동해 특정 시점에 에너지 교환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또한 변수로 작용한다.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구의 하루 길이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 분포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조석 마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구의 회전 에너지는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잃은 에너지는 달 궤도로 전달돼 달의 후퇴를 앞당기게 된다.
이처럼 두 천체가 속도를 맞추는 까닭은 조석력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조석력만으로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달이 지구 자기장의 꼬리 영역을 지날 때 전자기적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런 미세한 힘이 달의 궤도 안정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또 다른 연구는 지구 내부의 핵–맨틀 경계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에너지 소산(消散)을 변수로 삼아 달의 궤도 진화를 더 정밀하게 설명하려 한다. 이처럼 최근에는 조석력뿐 아니라 자기장, 지구 내부 마찰, 해양 변화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접근이 늘어나면서 지구–달을 통합된 행성 시스템으로 파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준 코레나 미국 예일대 지질학과 교수는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초기 달의 후퇴가 늦춰진 원인을 밝히는 일은 달의 기원과 내부 변화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며 “달의 궤도 진화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지구의 회전 속도 변화나 초기 환경도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