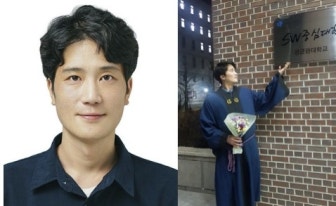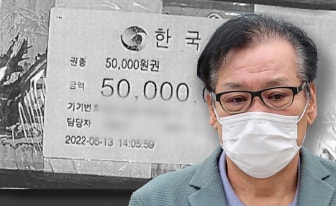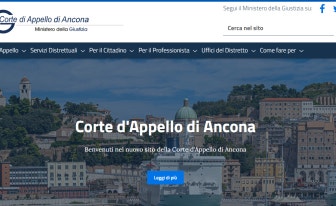미국은 브라질 커피를 가장 많이 수입해온 국가다. 브라질 커피수출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브라질로부터 커피 814만1817포대(포대당 60㎏ 기준)를 사들였다. 이는 미국 전체 커피 유통량의 33%에 달한다. 2~5위 국가의 수입량을 보면 독일(759만6232포대), 벨기에(437만9608포대), 이탈리아(391만7585포대), 일본(221만6800포대) 등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례적으로 브라질산 커피 수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며 ‘구원 투수’로 나섰다. 주브라질 중국대사관은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183개사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다며 이 조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미(對美)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라질 커피를 대신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브라질 커피를 93만9087포대 수입했다. 수출국 순위로 보면 한국(105만6518포대·12위)보다 낮은 14위다. 차(茶) 문화가 발달한 중국의 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16잔으로 세계 평균 240잔에 비해 턱없이 적다. 다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커피 소비량이 늘어 최근 5년 사이 커피 수입량이 6.5배 증가했다. 중국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상대적으로 가까운 커피 생산국이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브라질 커피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분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마르시오 페레이라 브라질 커피수출협회 회장은 “중국의 커피 대량 수입 결정은 브라질 농가에 더없이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전쟁에 대비해 브라질로부터 대두(콩)도 대량 수입할 계획이다. 올해 풍작으로 대두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온 브라질 대두 농가들은 중국의 이런 방침에 안도하고 있다. 브라질 농업 컨설팅업체 셀레레스 컨설토리아는 2025~2026년(2025년 9월 1일~2026년 8월 31일) 브라질 대두 수확량을 지난 시즌보다 2.5% 증가한 1억7720만t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우려해 미국산 대신 대체 공급국으로부터 대두 수입을 크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브라질과 중국은 신흥경제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 회원국으로서 반미·반서방 정책을 주도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양국 지도자도 돈독한 관계다. 룰라 대통령은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포럼’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브라질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관세 상한 조항 등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하자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세우수 아모링 브라질 대통령 수석 고문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브라질이 무분별한 관세 괴롭힘에 저항하는 것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모링 고문도 “미국이 브라질에 고율 추가 관세를 부과해 정상적인 경제·무역 관계를 훼손하고 브라질 내정에 간섭했다”면서 “브라질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중국이 브라질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2차 관세 위협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전망이다. 캐나다 금융조사업체 BCA리서치의 매트 거튼 수석 지정학 전략가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핵심 자원 확보에 있다”면서 “러시아산 원유는 계속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국가 이익에 맞춰 에너지 공급을 조처할 것”이라면서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러시아·중앙아시아 전문가인 리리판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위안화와 루블화로 원유 거래를 하고 있고 이는 미국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방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양국 지도자도 지금까지 40여 차례나 정상회담을 갖는 등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월 31일~9월 1일 톈진에서 개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 자국 제품의 동남아 각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막으려는 미국의 의도에 맞서 동남아 각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시 주석은 4월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를 방문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5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6월에는 시 주석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를 베이징으로 초청해 “역사의 바른편에 서서 다극 세계를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반발하는 국가들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 국가들은 과거와 달리 자발적으로 중국과의 외교·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영향력을 확대해주고 있다며 환호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향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시장 가치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의 최근 외교 전략은 ‘트럼프가 마음대로 요리하도록 두는 것(Let Trump cook)’”이라면서 “중국은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벌이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덕분에 국제질서 수호자를 자처하는 등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